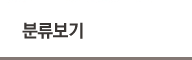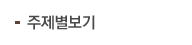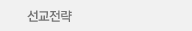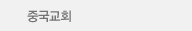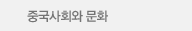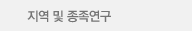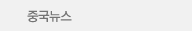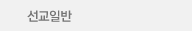중국기독교회사최종.jpg)
강희제가 선교사들에게 베푼 관용
1670년 강희제의 ‘봉지귀당(奉旨歸堂)’ 조치로 선교사들은 사역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일부 조정대신과 지방관 사이에는 천주교 세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절강순무(浙江巡撫) 장붕핵(張鵬翮)은 1674년(강희 13년) 관내 천주교 금령을 내리고 교당 철거를 시도했다.
항주(杭州) 예수회 선교사 인토세타(殷鐸澤, Prospero Intorcetta, 1626-1696)는 이 상황을 토마스 페레이라(徐日升, Tomás Pereira, 1645-1708)와 안토이네 토마스(安多, Antoine Thomas, 1644-1709)에게 보고하였고, 토마스는 강희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1692년(강희 31년) 정월 30일 강희제는 서양인은 역법 문제를 해결하고, 무기 제조에 기여 하였으며, 천주교는 악하고 문란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월 2일에도 러시아 정벌에 공로가 있으며 악하고 문란한 일이 없으므로 천주교를 사교로 보고 금할 근거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결국 천주교를 사교로 금하려는 움직임은 힘을 잃었고,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천주교 선교사들은 거주(居住), 묘지 지키기(守墳), 경건한 수양(虔修) 등의 명분으로 각지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청조의 현안에 기여한 바를 강희제가 인정하여 내려진 관용이자 우대 조치였다.
각급 수도회의 중국 진출과 갈등
16세기까지 중국 선교활동은 포르투갈 정부의 선교보호권 아래에서 예수회가 주관해 왔다. 그러나 1600년 교황 클레멘스 8세(Clemens, 재위 1592-1605)가 다른 수도회도 중국에 들어가 선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예수회 이외의 수도회도 앞다투어 중국으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626년과 1629년, 스페인의 도미니크회가 대만 기륭(基隆)과 담수(淡水)에 교당을 세웠고, 1630년 도미니크회의 선교사 코퀴(高奇, Angel Coqui), 1633년 모랄레스(黎玉范, Juan Bautista de Morales. 1597-1644)가 잇달아 복건(福建)성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쳤다. 모랄레스와 함께 복건성에 들어온 스페인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안토니오 카발레로(利安當, Antonio de Santa Maria Caballero, 1602-1669)는 같은 해 중국 천주교 신도 나문조(羅文藻)에게 영세를 베풀었고, 1643년에 프란치스코회 중국선교구 회장을 맡았다. 그는 1650년 산동(山東)으로 이동하여 제남(濟南)에 교당을 세웠고, 1659년에 중국 신도 1,5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회보다 늦게 중국에 들어온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은 미리 기득권을 차지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견제를 감수하면서 선교를 전개하였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1665년 도미니크회는 중국 각지에 11개 본원과 20개 교당을 세워 신도가 1만 명에 육박했고, 활동 지역은 절강과 복건, 광동(廣東)까지 이르렀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중국 진출
1676년 예수회 중국선교구 교구장에 임명된 페르비스트는 1678년에 〈전 유럽 예수회 선교사에게 고하는 글(告全歐州耶穌會士書)〉을 전송하여 유럽 각국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선교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1684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이에 호응하면서 자국의 식민지 이익을 위해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쟝 퐁타니(洪若翰, Jean de Fontaney, 1643-1710), 제르비용(張誠, Jean-François Gerbillon, 1654-1707), 요아킴 부베(白晋, Joachim Bouvet, 1656-1730), 콩트(李明, Louis Le Comte, 1655-1728), 비즈델로(劉應, Claude de Visdelou, 1656-1737) 등 5명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1685년 3월 5일 쟝 퐁타니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사절단 일행 5명은 브레스트(Brest, 프랑스 북서부 항구 도시)항을 출발하여 마카오를 거쳐 1687년 7월 영파(寧波)에 도착하였고, 1688년 북경(北京)에 들어온 이들은 요아킴 부베와 제르비용은 북경에서, 다른 셋은 기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새로 생겨난 파리외방선교회도 중국에 들어왔다.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뒤늦게 뛰어든 프랑스는 급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천주교의 중국선교도 적극 후원하였다.
종좌대목구(宗座代牧區)의 시행
교황청은 전 세계에 천주교 전파를 강화하기 위해 1622년 전신부(傳信部)를 조직하여 세계 선교를 관장하게 하였고, 아울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던 선교보호권에 대한 견제를 통해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로마 교황청은 종좌대목(Vicar Aposolic)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교황청은 1658년 8월 17일 파리외방선교회 선교사 프랑소와 팔루(陸方濟, Mgr. François Pallu, 1626-1684)와 피에르 모테(馬德, Pierre Lambert de la Motte, 1624-1679) 2명을 종좌대목으로 임명하여 중국 남부지역의 교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1660년에는 코톨렌디(郭刀楞理, Ignce Cotolendi, 1630-1662)를 남경(南京)과 화북 지역을 관장하는 종좌대목으로 임명했다.
종좌대목은 교황에게 직접 임명받고 교황청 직속인 전신부의 지도를 받아 포르투갈 국왕이 임명한 주교와 중국에서 대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로마 교황청의 이러한 견제 조치에 정면으로 맞서 1688년, 동방으로 떠나는 모든 선교사는 포르투갈에서 출발하고 포르투갈 국왕의 선교보호권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맹세하도록 했다.
로마 교황청은 어쩔 수 없이 타협에 나서 1690년 남경과 북경, 마카오 3개의 교구(敎區)는 포르투갈이 관리하도록 했지만, 1693년에는 중국을 12개 교구로 분할하여 주교구와 종좌대목구를 공존하게 하였다. 포르투갈 관할의 3개, 교구 즉 남경교구에서 강남(현 강소성과 안휘성)과 하남지역을, 마카오 교구에서 양광(현 광동성과 광서성)지역을 관할하고, 북경교구가 산동과 화북지역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곧 복건, 절강, 강서, 호광(현 호남성과 호북성), 귀주, 운남, 사천, 산서와 섬서의 9개 교구로 나누었다.
17세기 중국선교는 선교의 문을 열었던 예수회와 후발 기타 선교회 간의 경쟁과 갈등, 포르투갈과 스페인 주도의 주교구 단위 선교보호권과 프랑스 진출 이후 신설된 종좌대목구 단위 교황의 치리가 병존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선교회와 선교사 간의 반목과 논쟁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이른바 의례논쟁(儀禮論爭)과 더불어 18세기 초 중국선교의 금지 조치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초 중국인 주교의 등장
나문조(羅文藻, 1616-1691)는 로마 교황청이 임명한 최초의 중국인 주교이다. 나문조의 자는 여정(汝鼎), 호는 아존(我存)이며 복건성 복안(福安) 출신이다. 1633년 프란치스코회 안토니오 카발레라 신부를 통해 입교하여 영세를 받고, 남경과 북경 등지에서 선교활동에 참여했다. 164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의 도미니크회의 성 토마스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650년 도미니크회에 가입한 후 1654년 마닐라에서 신부 서품을 받았다.
1664년 역법투옥사건 이후 서양인 선교사들이 대거 광주(廣州)에 연금되었지만, 나문조는 중국인 사제로 자유롭게 전국의 교무를 관리하고, 역법투옥사건이 진행되는 3년여 동안 2,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674년 교황 클레멘스 10세(재위 1670-1676)는 나문조와 바실레아(Basilea)를 주교와 남경 종좌대목으로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도미니크회 필리핀 선교성 회장 칼데론(嘉得朗, Anyonius Calderon)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나문조는 1685년 광주에서 이탈리아 선교사 키에사(伊大仁, Bernardinus della Chiesa, 1644-1721)에 의해 주교로 임명되었다.
나문조는 1688년 중국 신도 3명을 신부로 축성(祝聖)했고, 중국에서 의례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신중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1690년 남경교구 주교로 임명되었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1691년 2월 27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문조가 축성한 3명의 중국인 신부 중 오어산(吳漁山, 1632-1718)은 강소성 상숙(常熟) 출신의 저명한 화가였다. 1675년 세례명 시몬 사비에르로 영세를 받은 그는 1681년 선교사 쿠플레(P. Philippe Couplet, 1623-1693)와 함께 마카오로 갔다. 그 이듬해 예수회에 가입한 오어산은 신학, 철학, 라틴어 등의 공부에 매진하면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였다. 그는 1688년 남경에서 나문조의 축성으로 만기연(萬起淵), 유온덕(劉蘊德)과 함께 신부 서품을 받았다.
오어산은 상해(上海)와 가정(嘉定) 등지에서 30여 년 동안 선교했으며, 1718년 상해에서 생을 마감하여 남문 밖 성모당 예수회 묘지에 안장되었다. 《묵정시초(墨井詩抄)》, 《삼파집(三巴集)》, 《묵정제발(墨井題跋)》 등을 남겼고, 그의 문필은 《묵정집》 5권으로 편찬되었으며, 최초의 중국인 신부의 설교집 《구탁(口鐸)》을 남겼다.
사진설명 | 나문조의 초상
사진출처 | 바이두
김종건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