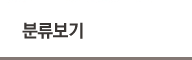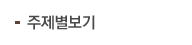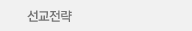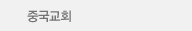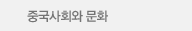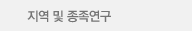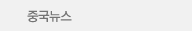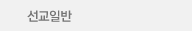지난 목차
서론
Ⅰ. 종교 문제
1. 종교에 대한 물음: 중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2. 기독교의 대안: 중국은 어떤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Ⅱ.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1. 근대 기독교 복음 메시지에서의 변화
2.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론(호교신학)의 등장
3. 신학적 평가
III. 기독교 신앙의 본색화 문제
1. 본색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했던 힘들
2. 오사운동 시기 지식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들
3. 본색신학의 건설을 향해
4. 신학적인 공통 기반, 공통된 원칙
IV. 민족주의: 반(反)기독교 운동에 미친 영향
1. 반(反)기독교운동: 초기의 발전, 1922년과 1924년의 반기독교 활동들
2. 제국주의의 도구라는 공격
3. 오삼십참안(五卅慘案, 5월 30일 사건)
4. 기독교 교육 - 민족주의의 걸림돌인가?
5. 국민당의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 아래의 기독교
V. 민족주의: 중국교회의 대응
민족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발원한 정치 현상이다. 이는 19세기에 들어 점차 서양 사회에서 유행하였으며 후에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통해 중국에도 들어왔다. 본질상 민족주의에는 두 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습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역사적인 유산의 복합체인 민족에 대한 자각이고, 둘째는 일종의 애국심, 곧 그런 민족 국가에 대한 애정 어린 헌신이다. 칼튼 J. H. 하이에스(喜士嘉頓)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의 이상 혹은 현실에 대한 충성이 다른 모든 충성들보다 앞선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국가)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그것의 본질적 우월성과 그것에 대한 ‘사명’을 깊이 믿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그런 마음상태”이다.1)
수 세기 동안 중국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유교 문화 전통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이웃의 ‘야만인[化外之民]’들과 구별된다고 자부하여 왔다. 비록 여러 왕조들이 등장과 몰락을 거듭했지만 자신들의 우월한 문명은 그에 방해받지 않고 본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국가’라고 하는 관념에 대한 중국인들의 헌신과 충성은 1912년 공화국이 세워진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었다. 전통 중국의 중심적 사회 단위는 가족이었으며, 가족은 그 구성원들에 대해 거의 배타(독점)적 요구를 행사하였다. 가족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국가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의 헌신을 크게 가로챘다. 유교가 제창한 효(孝)는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다. 《효경(孝經)》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효(孝)는 불변하는 하늘의 진리이고, 다함이 없는 땅의 정의(正義)이며, 인간이면 누구나 행해야 할 바이다.”2) 오뢰천(吳雷川)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인의 전통에서 사람들은 오직 가족[家]만을 알 뿐 국가[國]는 알지 못했다.3)
유사한 맥락에서 어떤 경우에는 중국인들에게서 부모에 대한 헌신이 실제로 황제에 대한 그것보다 우선시되었다. 맹자가 가르친 바와 같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 (……) 어느 것이든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섬김의 근본이다”4) 즉, 효는 중국 윤리의 근기(根基)였다. 1859년에서 1861년까지 제위에 있었던 청나라 황제 함풍제(咸豊帝)는 태평천국의 난 기간 동안 많은 관리들이 가정사를 돌보기 위해 사직하였다고 불평했다.5) 심지어 귀족과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애국심은 다만 황제에 대한 충성에 제한되었으며, 황제는 자주 자신이 천명(天命)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국가(민족) 관념은 모호하고 미발달된 상태로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오래된 유교적 세계관은 서양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부터 흔들렸다. 공화국 초기 몇 해 동안 있었던 반(反)유교운동에서 보여 진 것처럼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이제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이 실로 낙후되었고 부족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죠셉 레벤슨(Joseph R. Levenson, 约瑟夫·列文森)의 분석에 따르면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점점 문화주의를 대체하여 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어떤 이유로 근대 중국인들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의 방식에서 도움을 구할 때, 전통 문화를 넘어서서 민족(국가)을 높이는 것, 곧 ‘천하(天下)’를 넘어 ‘국가(國家)’를 높이는 것은 그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 중 하나였다. 그들은 만약 그 변화가 민족(국가)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는 마땅히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기준은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전통과의 단절에 대한 요청을 정당화하였고, 또한 전통의 몰락을 생각할 때의 침울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6)
이 시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형식상 상당히 모호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그 지역(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긍정적 의식이라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실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전통(문화)적 정체성이 도전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과거의 중국에 대해 거의 신뢰를 잃었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서양의 대안에 대해 환영하고 심지어 열망하고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서방 국가들의 중국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코 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 당시의 지식인들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문화적 거점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의식 형태에서 여러 다양한 정치사상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의 민족주의의 윤곽을 더듬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공격(침략)적이었다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인 것이었다. 중국의 정치적 전통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 줄곧 중국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왔었다. 스테판 네일(Stephen Neill) 주교(主敎)는 자신의 《식민주의와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은 외국인들을 자신의 지배에 종속시키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적 민족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팽창과 동화(同化)의 지치지 않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금지된 길들에로 천천히 그러나 저항할 수 없게 움직여 나아갔다. 국경을 넘어 지금의 베트남과 태국에 있었던 것들에로 나아갔으며, 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고 유지하였다. 중국 민족은 지속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그래서 야만인들 사이에서 일부를 어둠으로부터 선명한 한낮의 빛으로 이끌었다.7)
중국은 수 세기 동안 유럽 대륙을 어지럽혔던 그러한 국제적 경쟁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유럽에서는 민족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팽창을 위한 그들 상호 간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한 것은 중국 정치에는 낯선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애국주의에는 서방 국가들과 같은 침략성 심지어 압박성마저도 결핍되어 있거나 혹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8) 일련의 정치적 시련들-불평등조약들, 영토의 조차, 의화단의 난에 대한 피해보상, 21개조 요구, 베르사유조약의 배신, 워싱턴 회의 등등- 후에 중국인들은 더 이상 국제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에 양보할 수 없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보전과 민족의 권리를 방어해야만 했다. 민족주의가 대두된 것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강력한 반응이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내부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어떤 국가들은 제국주의 세력이 되었던 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이것이 서양을 좇아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될지 어떨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었다. 많은 서양인들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였다. 그러나 어떤 중국인 기독교인들은 중국 민족의 전통 도덕이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중국인들의 평화를 향한 열망과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관후한 국량(局量)이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야심을 결코 가지지 않는 일종의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가꾸어갈 것이라는 것이다.9)
양계초(梁啓超)의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이 발간되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흐름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곧 서양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과학과 민주는 이미 정통(正統)의 원칙(orthodox principles)이 되었다. 그렇지만 서양을 본받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 지식인들의 마음속의 모순된 심리마저 은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스승’이 곧 자신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의 정서는 서양과 동등해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려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온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한 원조를 주동하여 많은 중국 내의 지식인 청년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중국이 곧 부강(富强)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그의 중국인 제자들에게 세계 혁명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레닌주의 이전에 많은 유럽의 공산주의들은 서양 국가들이 혁명의 진전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역할은 경시되었다. 비록 손중산(孫中山)은 소비에트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결코 자신의 삼민주의(三民主義)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삼민주의를 신(新)중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으로 생각하였다. 손중산은 1924년 이전에는 결코 공식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공산당과 연맹을 맺은 뒤 1924년에 행한 삼민주의에 관한 연설에서부터 그는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본다면 공산당의 관념이 중서(中西)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에는 손중산은 제국주의에 대해 영토 팽창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 중국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10)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레닌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 표현한 것과 같은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의 목표는 모든 불평등조약들을 제거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민국(民國)이 성립된 이래 국민들이 줄곧 소망해온 바이기도 하였다.
1920년대 10년간 반(反)기독교운동을 뒷받침했던 양대 정치 세력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였다.11) 비록 2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운동은 아직 강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기독교 선전과 적대행위들을 지탱하는 한쪽 기둥이었다. 민족주의적 정서는 반기독교운동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추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그것의 공헌은 국민당이 자신의 힘을 공고하게 했던 20년대 후반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한패라고 하는 외부 세력들의 비난에 반박하기 위해 중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변증 작업을 통해 이들 두 강대한 세력들에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다.
1.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
오사(五四)운동 기간 동안 각종의 정치사상들이 중국 지식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중에는 다양한 형식의 사회주의가 있었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학생들 사이에서 보편화가 된 구호였다. 사회주의12)사상은 한 시기를 풍미하였으며,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정치 이데올로기들과 인기를 다투었다. 마르크시즘, 볼셰비즘, 아나키즘은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민국일보(民國日報)》, 《신조(新潮)》, 《신청년(新靑年)》, 《해방(解放)》, 《소년중국(少年中國)》 등 당대의 잡지에 등장하였다. 이대조(李大釗), 진독수(陳獨秀), 장동손(張東蓀), 버트란트 러셀(羅素), 이석증(李石曾), 오치휘(吳稚暉) 등의 글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주의사상 학파들이 소개되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실현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양계초는 일찍이 “사회주의운동의 성패는 자본가 계급의 출현과 노동자 계급의 정착에 달려 있음”13)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진독수는 오히려 “중국의 개조와 존립은 대부분 국제 사회주의운동과의 공조에 달려 있다. 그것은 피하거나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자본가 계급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외국 자본주의의 압박은 사람들마다 모두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계급투쟁 관념은 중국인들이 발전시켜야 할 바의 것이다.”14)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중국과 같이 산업화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분열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예측하였다. 레닌의 논점은 세계혁명운동에서 중국이 담당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었다.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연합 정부 내에는 각종의 다양한 사회주의 혁명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15) 이대조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어떻게 마르크스사상을 중국의 농민 계층의 맥락에 맞게 운용(변형)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손중산은 소비에트의 최근 혁명의 성취에 감명을 받았고, 또한 서방에서는 경제 원조를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좌경 노선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일부 국민당 소속 지도자들, 예를 들어 대계도(戴季陶), 호한민(胡漢民), 요중개(廖仲凱) 등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일부 관념들을 받아들였다.
1)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서는 사회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장역경(張亦鏡)에게 “자본주의 체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16) 양균묵(梁均黙)은 “자본주의는 기독교의 주적(主敵)이다.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오직 그것을 배척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가지지 않는다.”17)라고 주장했다. 중국 기독교청년협회(YMCA)의 간사 장사장(張仕章)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사회주의 모두는 각종의 소유(재산)는 사회에 맡겨져야 하며 사회의 공적인 사용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찬성하며, ‘자본주의’와 유산(遺産)제도에 반대한다.”라고 말하였다.18)
양균묵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곧 사회의 소수에 의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적인 소유를 가리킨다. 양균묵은 평론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적 예수는 자본주의에 반항했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례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자본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의 제자(신도)들 중 많은 이들이 모두 무산계급(無産階級, 프롤레타리아)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富)에 대한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인들의 청지기 관념 속에서 모든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균등하게 무산계급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신(神)에게 속하였고 우리 인간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9)
장역경은 일찍이 지상에 쌓아놓은 재물의 취약성 및 일시성을 하늘에 쌓아 놓은 재보(財寶)의 불후성 및 영구성과 대조하면서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에 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양자 사이에서 반드시 결단하고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21) 예수의 생활 원칙(삶의 방식)은 어떠한 자본주의적 주장도 배척한다. 그는 스스로 또한 항산(恒産)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라고 하셨다.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왜 자본주의가 악이며 중국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해 신학적인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중국 사회에서 몰아내고자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식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은 반드시 선한(복된) 것은 아니다.
남부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세력이 매우 커서 적지 않은 학생, 노동자,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역경과 양균묵은 불필요하게 그들의 관점들을 비방하기보다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22) 그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했던 것은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보려는 반기독교 인사들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그들은 반기독교 인사들의 공격과 비판이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그렇지만 다른 기독교 대변인들, 예를 들어 금릉신학원(金陵神學院)의 미성여(米星如)와 같은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의 태도는 개혁적이었으나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약점을 폭로하기에 앞서 그것의 본질과 작용(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성여는 “우리는 모든 현존하는 제도들을 뒤집으려는 무정부주의자들과는 같지 않으며, 또한 모든 재산의 공유(公有)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들과도 같지 않다.”고 말했다.23) 그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부패하였고 사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유재산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니며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를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인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성여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사적 소유를 개인들의 손에로 돌려주었다. 사유재산제도도 그 나름대로의 확고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곧 공·상업(工商業)의 경쟁을 통해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며 독립적 정신을 건립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24) 미성여는 ‘사용을 위한 소유(property for use)’와 ‘권력을 위한 소유(property for power)’ 사이를 구분하고 단지 후자만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게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질서 문제는 사용을 위한 소유를 권력을 위한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의 대부분의 재부(財富)가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간 데 기인한다.
미성여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사용을 위한 소유의 체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제도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며 더욱이 그로 말미암아 사회에 복무한다는 정신을 소홀히 하게 되기 쉽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마땅히 그 제도의 병폐를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수준 모두에서 개선하여 ‘사용을 위한 사유재산제도’로 ‘권력을 위한 사유재산제도’를 대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선교와 제국주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주구(走狗, 앞잡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던가? 당대의 중국 지식인들이 참고하였던 《신문화사서(新文化辭書)》는 제국주의에 대해 논하여 다음과 말하였다.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으려 할 때, 그 사람은 국가와 사회를 향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은 자신의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만약 인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최상의 권위가 결여되어 있다면,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자신의) 인민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주장이다. 제국주의는 침략주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더구나 제국주의는 단지 방어적인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를 희망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접한 나라들을 침략하는 데로 나갈 수도 있다.25)
대다수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언급한대로 제국주의의 이러한 침략적 정책과 기독교가 주장하는 희생, 봉사 그리고 사랑(박애)의 윤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북경청년협회 간사 진립정(陳立廷)26)의 관찰에 따르면 제국주의에는 또 하나의 함의가 있다. 즉, 제국주의는 개인주의가 발전한 한 형태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자신과 대립하는 권위와 사상은 어떤 형식이든 억압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제국주의 정신의 일부이다.27)
레닌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이다. 그것은 산업화가 된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위한 해외 시장을 찾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나타난다.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함으로써 자본주의자들은 낙후된 국가들의 노동 대중들을 포함한 새로운 무산계급을 창출하며 세계를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눈다. 모든 피압박 국가의 인민들은 혁명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며 단결하여 일어나 착취 계급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제 반(反)제국주의는 공산주의의 주요한 선전도구로서 식민지 및 준식민지 국가들에서 무산계급을 의식화하고 혁명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공산주의 프로그램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가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주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거의 모든 기독교 대변인들이 제국주의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자신들이 제국주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그 옛날 로마제국주의에 항거하였던 나사렛인 예수야말로 실로 오늘날 반제국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는 일찍이 또 하나의 일종의 유대적 제국주의를 탄생시켜 지방 정부들과 대립하게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기를 거부한 바 있었다.28) 제국주의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당시의 억압 체제와의 투쟁에 자신을 헌신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진립정은 제국주의와 선교 사업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제국주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압적인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하였던가? 둘째, 기독교는 기꺼이 제국주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였던가?29) 그는 만약 기독교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잘못이 아니라 조종한 자들의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는 다윈의 적자생존이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철혈(鐵血) 통치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진화론이 곧 독일의 침략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어떠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착취 세력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기독교 인사들은 종종 이전에 발생했던 교안(敎案)을 이용하여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죄악을 범하여 중국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고 질책하였다. 특히 독일의 산동(山東) 점거와 의화단 사건의 배상금 사건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로 자주 인용되어 선교 사업을 공격하는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진립정에 의하면 두 명의 독일인 가톨릭선교사들이 살해된 사건은 마침 자신들의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지를 세울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독일 정부에 의해 이용된 것일 뿐이다. 근대의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교안들 역시 질이 좋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비호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독교 선교를 일종의 문화적 침략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침략은 문화 발전의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 문화의 역사에서 두 문화 사이의 융합은 각자의 최상의 것을 흡수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가져왔었다.30) 송대(宋代) 신유학(新儒學)의 학술은 전통 유교와 외부에서 수입된 불교가 종합된 결과였다. 조자신(趙紫宸), 위탁민(韋卓民), 진립정과 같은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중국 문명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문화적 결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 예를 들어 진립정은 기독교는 신을 모든 사람의 천부(天父,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세계를 한 가족으로 보는 대가족주의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지상(至上)적인 중국 사회와 잘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31)
반기독교 인사들이 기독교 선교와 제국주의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19세기 기독교의 동래(東來)는 군함과 불평등조약들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다.
둘째,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또한 동시에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었다.
셋째, 여러 선교사 관련 사건[敎案]들이 서구 열강들에 의해 중국 정부로부터 영토의 조차와 배상금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넷째, 기독교는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중국 인민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압제와 부패를 신적인 예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민들의 혁명적 정신과 사회에 대한 개혁에의 열성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혁명적 개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쉽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들은 근대 중서관계의 역사적 증거들에 의해 잘 입증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고발자와 옹호자 사이의 입장이 갈리게 된다. 즉, 전자에서 그것들은 선교 사업이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후자에서 그러한 연결은 결코 인과적 관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며, 적절한 역사상(歷史像)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다른 요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쉽게 인지되지 못하였다. 어떻게 그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교도’의 중국에 온 선교사들의 종교적 열심에 동감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들이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로 흩어지는 선교사들의 동기가 정치적 책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선교사가 정치인들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서구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지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기독교회들의 잘못된 행위들과 반기독교운동들의 악의적인 선전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측의 어떤 변명도 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반기독교 인사들에게 있어 그 ‘거룩하지 못한 연합’은 아무리 많은 양의 성수(聖水)를 그 위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더렵혀진 채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중국 기독교인들은 서보겸(徐寶謙)의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동조하였다. “중국 내부의 지식인 계층 중 적어도 일부는 비록 기독교가 역사상 그리고 사실상 제국주의와 연결되거나 혹은 그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증거도 적지 않으며 따라서 기독교와 제국주의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32)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기독교 대변인들은 사회주의운동과 기독교운동 사이에는 매우 큰 목적의 유사성이 있다고 단언하였다. 둘 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며 모두 현재의 사회질서가 너무나 타락하였고 사악하다고 느끼며 동시에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비교 연구하면서 장사장은 그것들은 둘 다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3) 다만 목표는 동일하지만 취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기독교의 이론에서는 교회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일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지만, 사회주의는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34) 기독교의 프로그램은 느슨하고 점진적인 반면에, 사회주의는 과감하고 혁명적이다. 기독교의 개혁은 보통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에로 확산되어 가지만, 사회주의는 먼저 사회적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그런 다음에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결코 기독교에 대해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에서 이미 어떤 형태의 공산주의적 생활 형식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자주 인용되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4-47).35)
양균묵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정신은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영혼의 자유를 가르쳤으며, 모든 인간 존재의 타고난 평등을 확언하였다.”36) 만약 사람의 양심이 그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그는 어떠한 계급 차별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가 비록 경제학에 기초를 둔 근대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근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의 공산주의와 근대 공산주의 사이에는 유사성만큼이나 차이도 많다.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상해(上海)대학 교수 첨위(詹渭)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초기 교회의 종교활동이 자원(自願)과 주동(主動)의 정신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재물의 공용(公用)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결코 사유재산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7)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으며, 모든 물건을 공용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따라 궁핍한 자를 도왔으며 그들을 구속하는 어떠한 집단적 강제도 없었다. 그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상호 부조의 정신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러한 자발성과 지체(肢體) 의식은 근대의 공산주의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주
1) Carlton J. H. Hayes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일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Carlton J. H. Hayes, Essays on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Co., 1926), p. 6. 그리고 Nationalism: A Religion (New York: Macmillan Co., 1960), pp.1-5. 참조.
2) 《孝經》〈三才〉 第七, “曾子曰, 甚哉孝之大也. 子曰, 夫孝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3) 吳雷川, 〈論中國基督徒對於國家應負的責任〉, 《生命月刊》 제5권 제5기 (1925년 2월), pp.5-7.
4) 《孟子》〈離婁 上〉, “孟子曰, 事孰爲大? 事親爲大. …… 孰不爲事? 事親, 事之本也”
5) C. H. Peake, Nationalism and Education in Modern China, pp.120-123. 참조.
6) Joseph Levenson,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p.104.에서 인용.
7) Stephen Neill, Colonialism and Christian Missio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6), pp.117-118.에서 인용.
8) 余日章 (David Z. T. Yui), 〈今日中國政治思想的觀察〉, 《靑年進步》 제91책 (1926.3), pp.4-5. 참조.
9) 胡貽穀(Y. K. Woo), 〈中國國家主義〉, 《靑年進步》 제93책 (1926.4), p.4, p.8.
10) 孫中山, 《總理全書》 전12권 (臺北: 國民黨中央委員會, 1956), 제5권 p.175 ; 제7권 제1부 pp.141-142.
11) 李大釗와 毛澤東에 의해 공식화가 된 중국적 공산주의는 외견상 강력하게 민족주의적이었다. 20세기 중국적 공산주의에 대한 훌륭한 글에서 모리스 마이스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李大釗에서와 마찬가지로 毛澤東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구원과 재탄생은 주요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前자본주의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건너 뛴) 사회주의로서의 재탄생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역사의 진보적 전진에 뒤떨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마르크스 교의의 개선에 착수했던 것은 이러한 재탄생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 비록 이러한 재탄생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중국 민족, 특별히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가치들에 따라 중국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했던 젊은이들의 에너지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舊중국의 가치들에 대한 이러한 매우 실제적인 거부는 중국적 전통들에 대한 민족주의적 애착과 중국 과거의 영광들에 대한 자신감에 동반된 것이었다.”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s of Chinese Marx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263.
12) 1920년대의 사회주의 이론들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주의는 일종의 민중운동으로서 그 목적은 私的所有(사유재산)에 반대함으로써 현존하는 사회 경제와 정치 조직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데 있었다.
13) 梁啓超, 〈社會主義硏究〉, 《改造》3.6. 張仕章, 〈中國的基督敎與社會主義〉, 《靑年進步》제56책 (1922년 10월), p.17에서 재인용.
14) 張仕章, 〈中國基督敎與社會主義〉, p.17.에서 재인용.
15) Cf.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p.247.
16) 張亦鏡, 〈批評非基督敎學生同盟宣言〉, 《批評非基督敎言論彙刊全編》, p.18.
17) 梁均黙, 〈批評盧淑的基督敎與資本主義〉, p.65.
18) 張仕章, 〈中國基督敎與社會主義〉, p.6.
19) 張仕章, 〈中國基督敎與社會主義〉, pp.63-65.
20) 張亦鏡, 〈批評非基督敎學生同盟宣言〉, p.18.
21) 梁均黙, 〈批評盧淑的基督敎與資本主義〉, p.63. 참조.
22) Cf. 《批評非基督敎言論彙刊全編》, p.2에 있는 張亦鏡의 評語.
23) 米星如, 〈基督敎對於資本治下三大問題應有的態度〉, 《靑年進步》 제66책 (1923년 10월), p.48. 참조.
24) Ibid., p.49. 참조.
25) 汪兆翔, 〈基督敎對於最近時局當有的態度和措施〉, 《文社月刊》 제2권 제8책 (1927년 6월), p.8.에서 인용.
26) 陳立廷은 1894년에 태어났다. 일찍이 燕京大學에서 수학하였으며, 그 후 1914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17년 졸업한 후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였다.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기독교청년협회(YMCA)의 전국위원회에 참여하여, 山東省의 노동자들의 복리사업을 담당하였다. 1928년 그는 北京 靑年協會(Y.M.C.A.)의 總幹事를 맡았으며, 또한 국립 北京大學에서 근대 역사를 가르쳤다. 그는 1929년에는 中國議院의 執行秘書가 되어, 太平洋會議(Institute of Pacific Relation)에 참여하는 등, 당시 정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27) 陳立廷, 〈基督敎與帝國主義〉, 《靑年進步》 제99책 (1927년 1월), p.8.
28) 陳筠, 〈基督敎對於最近時局當有的態度和措施〉, 《文社月刊》 제3권 제3책 (1928년 1월), p.6.
29) 陳立廷, 〈基督敎與帝國主義〉, p.9.
30) Cf. Wei Cho-min(韋卓民), "Synthesis of Cultures East and West", pp.74-80.
31) 陳立廷, 〈基督敎與帝國主義〉, p.11.
32) 徐寶謙, 〈反基督敎運動與吾人今後應採之方針〉, 《生命月刊》 제6권 제3기 (1926년 3월), p.1.
33) 張仕章, 〈中國的基督敎與社會主義〉, 《靑年進步》 제56책 (1922년 10월), pp.4-6.
34) Ibid., pp.6-7.
35) 이 구절은 많은 현대의 저술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梁均黙의 〈批評綺園的基督敎與共産主義〉, p.82. 그리고 詹渭, 〈基督敎與共産主義的中國社會改造觀〉, 《靑年進步》제94책 (1926년 6월), p.2.
36) 梁均黙의 〈批評綺園的基督敎與共産主義〉, pp.82-83. 또한 Hsü Shih-kuei, 〈耶穌基督和社會主義的我見〉, 《靑年進步》 제66책 (1923년 10월) pp.44-47.
37) 詹渭, 〈基督敎與共産主義的中國社會改造觀〉, 《靑年進步》 제94책 (1926년 6월), p.94.
사진 | 바이두
문석윤 |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