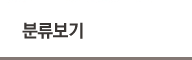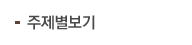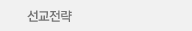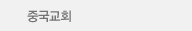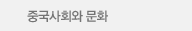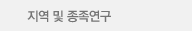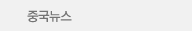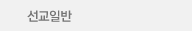한국어 관용어를 중국어로 통역하고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용어(惯用语)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는 낱말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를 말한다. 다시 말해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이다. 때로는 문법에 맞지 않지만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결합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 속담, 고사성어, 격언 등도 넓은 의미에서 관용어에 속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한∙중 관용어 중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유(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머리가 굵다.’ 이 관용어는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관용어로는 ‘머리가 크다’가 있다. 이 한국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翅膀硬了’ [chìbǎngyìng·le]으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날개가 단단해지다’이다. 이 말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자식이 다 컸다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머리’라는 제유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날개’라는 제유를 사용한다.
2.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이 관용어는 ‘일이 몹시 절박하게 닥치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하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성어는 ‘火烧眉毛’ [huǒshāo méi máo]로 이 말을 번역하면 ‘불이 눈썹을 태우다’이다. 이 말은 ‘사태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 매우 절박함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발등의 불’을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눈썹을 태우다’를 제유로 사용한다.
3.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이 속담은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半瓶醋晃荡’ [bànpíngcù huàng‧dang]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 ‘식초 반 병은 흔들린다’이다. 이 말은 식초가 병에 가득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반쯤 차 있으면 흔들린다는 뜻으로 ‘지식이나 능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별로 정통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아는 체하면서 요란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빈 수레’를 제유로 사용한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반 병의 식초’를 제유로 사용한다.
4. ‘식은 죽 먹기.’ 이 관용어는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죽이 뜨거우면 식혀서 먹어야 하는데 이미 식은 죽은 먹기가 쉽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不费吹灰之力’ [bú fèi chuī huī zhī lì]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재를 불 힘조차도 쓰지 않는다’이다. 이 말은 ‘너무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아주 쉽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식은 죽’을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재를 부는 힘’을 제유로 사용한다.
5. ‘양다리를 걸치다.’ 이 관용어는 ‘어떤 사람이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보려고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관용어로는 ‘두 다리를 걸치다’가 있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脚踏两只船’ [jiǎo tà liǎng zhī chuán]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발로 두 척의 배를 밟다’이다. 이 말은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양다리’를 제유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두 척의 배’을 제유로 사용한다.
6. ‘물에 빠진 생쥐.’ 이 관용어는 ‘물에 흠뻑 젖어 몰골이 초췌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落汤鸡’ [luò tāng jī]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물에 빠진 닭’이다. 이 말은 물에 젖어 초췌한 모습을 가리키거나 궁지에 빠진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물에 젖어 초췌한 모습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물에 빠진 생쥐’를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물에 빠진 닭’을 제유로 사용한다.
7. ‘재탕하다.’ 이 단어는 원래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 번 달여 먹은 한약재를 두 번째 달인다’는 뜻이다. 이 말이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한 번 썼던 말이나 일 따위를 다시 되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炒冷饭’ [chǎo lěngfàn]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찬밥을 데우다(볶다)’이다. 이 말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예전에 했던 말이나 일 따위를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되풀이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한국어에서는 ‘(한약을) 재탕하다’를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찬밥을 데우다’라는 제유를 사용한다.
8. ‘알랑방귀를 뀌다.’ ‘알랑방귀’라는 단어는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알랑방귀를 뀌다’라는 관용어는 ‘알랑거리면서 아첨을 떨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拍马屁’ [pāi mǎ pì]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말의 엉덩이를 두드린다’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다. 아부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원래 중국 원(元)나라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윗사람 소유의 말 엉덩이를 치면서 좋은 말이라고 칭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아부하거나 아첨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아첨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알랑방귀'를 제유로 사용한 반면 중국어에서는 ‘말의 엉덩이’를 제유로 사용한다.
9. ‘속이 보이다.’ 이 관용어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어로는 ‘뱃속을 들여다보다’가 있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肚子里的蛔虫’ [dùzi lĭ de huíchóng]이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뱃속의 회충’이다. 이 말은 ‘(뱃속에 있는 회충같이) 남의 심리활동을 훤히 알고 있다’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어에서는 ‘속(마음)’ 혹은 ‘뱃속’을 제유로 사용하여 ‘속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뱃속의 회충’을 제유로 사용한다.
10. ‘배가 맞다.’ 이 관용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마음이나 배짱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어로는 ‘호흡을 같이하다’가 있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穿一条裤子’ [chuān yì tiáo kù‧zi]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두 사람이) 바지 하나를 입다’이다. 또는 ‘一个鼻孔出气’ [yí‧ge bíkǒng chūqì] (一鼻孔出气 [yì bíkǒng chū qì]) 라는 관용어도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한 콧구멍으로 숨을 쉬다’이다. 이 두 관용어의 뜻은 ‘서로의 관점과 견해, 주장과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여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배’나 혹은 ‘호흡’을 제유로 사용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바지’와 ‘한 콧구멍’을 제유로 사용한다.
1. ‘머리가 굵다.’ 이 관용어는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관용어로는 ‘머리가 크다’가 있다. 이 한국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翅膀硬了’ [chìbǎngyìng·le]으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날개가 단단해지다’이다. 이 말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자식이 다 컸다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머리’라는 제유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날개’라는 제유를 사용한다.
2.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이 관용어는 ‘일이 몹시 절박하게 닥치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하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성어는 ‘火烧眉毛’ [huǒshāo méi máo]로 이 말을 번역하면 ‘불이 눈썹을 태우다’이다. 이 말은 ‘사태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 매우 절박함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발등의 불’을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눈썹을 태우다’를 제유로 사용한다.
3.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이 속담은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半瓶醋晃荡’ [bànpíngcù huàng‧dang]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 ‘식초 반 병은 흔들린다’이다. 이 말은 식초가 병에 가득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반쯤 차 있으면 흔들린다는 뜻으로 ‘지식이나 능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별로 정통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아는 체하면서 요란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빈 수레’를 제유로 사용한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반 병의 식초’를 제유로 사용한다.
4. ‘식은 죽 먹기.’ 이 관용어는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죽이 뜨거우면 식혀서 먹어야 하는데 이미 식은 죽은 먹기가 쉽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不费吹灰之力’ [bú fèi chuī huī zhī lì]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재를 불 힘조차도 쓰지 않는다’이다. 이 말은 ‘너무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아주 쉽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식은 죽’을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재를 부는 힘’을 제유로 사용한다.
5. ‘양다리를 걸치다.’ 이 관용어는 ‘어떤 사람이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보려고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관용어로는 ‘두 다리를 걸치다’가 있다. 이 관용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脚踏两只船’ [jiǎo tà liǎng zhī chuán]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발로 두 척의 배를 밟다’이다. 이 말은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두 편에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양다리’를 제유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두 척의 배’을 제유로 사용한다.
6. ‘물에 빠진 생쥐.’ 이 관용어는 ‘물에 흠뻑 젖어 몰골이 초췌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落汤鸡’ [luò tāng jī]이며, 이 말을 번역하면 ‘물에 빠진 닭’이다. 이 말은 물에 젖어 초췌한 모습을 가리키거나 궁지에 빠진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물에 젖어 초췌한 모습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물에 빠진 생쥐’를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물에 빠진 닭’을 제유로 사용한다.
7. ‘재탕하다.’ 이 단어는 원래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 번 달여 먹은 한약재를 두 번째 달인다’는 뜻이다. 이 말이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한 번 썼던 말이나 일 따위를 다시 되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炒冷饭’ [chǎo lěngfàn]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찬밥을 데우다(볶다)’이다. 이 말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예전에 했던 말이나 일 따위를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되풀이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한국어에서는 ‘(한약을) 재탕하다’를 제유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찬밥을 데우다’라는 제유를 사용한다.
8. ‘알랑방귀를 뀌다.’ ‘알랑방귀’라는 단어는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알랑방귀를 뀌다’라는 관용어는 ‘알랑거리면서 아첨을 떨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拍马屁’ [pāi mǎ pì]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말의 엉덩이를 두드린다’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다. 아부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원래 중국 원(元)나라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윗사람 소유의 말 엉덩이를 치면서 좋은 말이라고 칭찬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아부하거나 아첨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아첨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알랑방귀'를 제유로 사용한 반면 중국어에서는 ‘말의 엉덩이’를 제유로 사용한다.
9. ‘속이 보이다.’ 이 관용어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어로는 ‘뱃속을 들여다보다’가 있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肚子里的蛔虫’ [dùzi lĭ de huíchóng]이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뱃속의 회충’이다. 이 말은 ‘(뱃속에 있는 회충같이) 남의 심리활동을 훤히 알고 있다’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어에서는 ‘속(마음)’ 혹은 ‘뱃속’을 제유로 사용하여 ‘속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뱃속의 회충’을 제유로 사용한다.
10. ‘배가 맞다.’ 이 관용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마음이나 배짱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어로는 ‘호흡을 같이하다’가 있다. 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는 ‘穿一条裤子’ [chuān yì tiáo kù‧zi]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두 사람이) 바지 하나를 입다’이다. 또는 ‘一个鼻孔出气’ [yí‧ge bíkǒng chūqì] (一鼻孔出气 [yì bíkǒng chū qì]) 라는 관용어도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한 콧구멍으로 숨을 쉬다’이다. 이 두 관용어의 뜻은 ‘서로의 관점과 견해, 주장과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여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배’나 혹은 ‘호흡’을 제유로 사용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바지’와 ‘한 콧구멍’을 제유로 사용한다.
사진 출처 | 百度 图片
석은혜 | 본지 전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