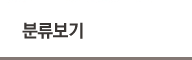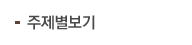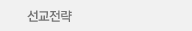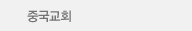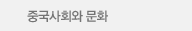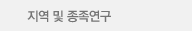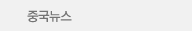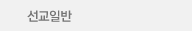원(元) 시대, 야리가온(也里可溫)으로 불리다
경교는 당(唐) 태종 시대에 이어 고종 때에도 보호를 받으며 확장되어 나갔다. 중국의 여러 곳에 ‘경교의 사원(景寺)’이 세워졌는데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에 있는 ‘사만백성(寺滿百城: 교당이 각 성읍에 가득했다)’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의 고관들 가운데도 경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고력사(高力士), 곽자의(郭子儀) 같은 무장들도 있었다. 이 무렵에 <대진경교선원본경(大秦景敎宣元本經)>을 비롯하여 경교의 여러 경전들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경교는 당 말기에 이르러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무종(武宗)은 회창(會昌) 5년(845년)에 회창멸법(會昌滅法)을 시행했는데 이는 불교를 표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래종교들도 함께 탄압의 회오리에 휩쓸리게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교는 결국 지상에서 사라졌다. 경교의 당나라 전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은 오늘날 기독교의 중국선교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경교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이르러 ‘야리가온(也里可溫)’이라는 이름으로 재흥하였다. 야리가온은 ‘복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아르카운(Arlcaun)’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박해를 피해 변방으로 흩어졌던 경교도들과 소수민족 가운데 있던 경교도들이 몽고족을 따라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들을 통해 경교가 다시 퍼지게 된 것이다.
원의 왕실은 야리가온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쿠빌라이는 불교도였음에도 숭복사(崇福寺)를 건립하여 야리가온에 대한 업무를 돌보게 하였다. 지금 중국에서 발굴되는 경교의 유물들은 대부분 원나라 때의 것이다. 경교의 유물에 대해서는 서양자(徐良子)의 《경교의 유물》(도서출판 순교의 맥, 1991년)이라는 역저가 있는데 이 책에는 이어 말할 신라와 고려 시대의 유물들도 언급되어 있다.
원나라 시절에 중국에 야리가온이 퍼져 있었음은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부터 경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되어 왔다. 경교의 우리나라 전래 가능성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1900년대 초 한국을 방문해 여러 해 머물렀던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인 고든(E. A. Gordon)이었다.
경교가 당에 전래되었을 때는 신라의 삼국통일 초기였고, 원 나라 때 야리가온이 성행했을 때는 고려왕조 때였다. 그래서 당과 통일신라와 밀접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를 바탕으로 경교의 신라유입설이 나왔고, 원과 고려의 교류를 통하여 몽골인들 사이에 유행한 야리가온 신앙이 고려인들에게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학자들이 나왔다.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1956년에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된 돌십자가와 전라남도 해남의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십자가(銅十字架)와 마리아상과 비슷하다는 관음상 등이 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객관적으로는 입증되지 못하고 가설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교에 대해 이해하려면 창시자인 네스토리우스(Nestorius)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려용덕〡 도봉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문학박사,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