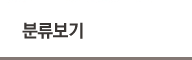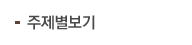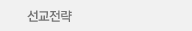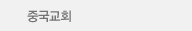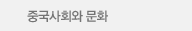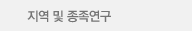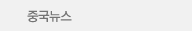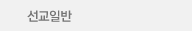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물의 도시 쑤저우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라고 극찬되던 곳이다. 옛 중국 사람들은 ‘쑤저우(蘇 州)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광저우(廣州)의 음식을 먹으며 항저우(杭州)의 시후(西湖)를 바라보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 리우저우(柳州)에서 만든 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쑤저우를 찾아가보면 거무스레한 가옥들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 오염된 운하, 우뚝 솟은 빌딩, 무질서한 거리 뿐, 하늘의 천당과 비교되었던 아름다운 낙원이 이미지나 옛 미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19세기 후반부터 상하이(上海)의 번영과 대조를 이루어 급격히 쇠퇴한 쑤저우는 단지 고도(古都)로 남게 되었지만, 명 ∙ 청대에는 중국 제일의 도시요, 문화의 중심지로 그 영화를 자랑하였다. 여기 저기에 역사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로 남아 있기에 오늘날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추시대 오(吳)나라의 중심지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쑤저우는 장쑤(江蘇)성 동남부의 창장(長江) 삼각주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상하이, 서쪽으로는 타이후(太湖), 그리고 북으로는 창장, 남으로는 저장(浙江)성과 접해 있다. 베이징과 항저우로 연결되는 대운하가 지나고 있으며 수로가 풍부한 도시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송대 이후 미곡 생산의 중심지로서 ‘江浙熟 天下足(장쑤와 저장 지방에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풍족해진다)’ , ‘蘇湖熟 天下足(장쑤의 쑤저우와 저장의 후저우에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풍족해진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쑤저우는 풍요를 자랑하면서 강남 지역 경제 ∙ 문화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가 되면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중국에 온 유럽인들이 놀랄 정도로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였다.
명, 청대에 쑤저우는 대도시로 발전하여 중국 제일의 상공업 ∙ 문화 ∙ 유행의 도시로서 이름이 높았다. 문인 및 예술가들이 싸롱에 모여 담론하고 서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호화 사치하여 이곳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여유와 풍류를 즐기는 이 지방 신사들은 산이 없는 탓에 집안에 산수를 들여놓고 정원을 만들어 자연과 벗삼으며 시문을 읊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래서 이곳엔 각양각색의 정원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중국 4대 정원이라 하면 쑤저우의 졸정원(拙政園), 류원(留園), 베이징의 이화원(頣和園), 청더(承德)의 피서산장(避暑山莊)을 드는데, 이 중 두 개가 쑤저우에 있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창랑정(滄浪亭), 사자림(獅子林) 등 현존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쑤저우의 견직업
명, 청대 쑤저우는 특히 견직업(絹織業)이 크게 성행하였다. 견직업은 중국 고대로부터 발전해 온 대표적인 산업으로, 송대에는 산둥(山東), 쓰촨(四川), 저장이 고급 견직업의 중심지였으나 명대에는 난징(南京), 쑤저우, 항저우가 중심이 되었다. 명 정부에서는 궁중의 복식품을 비롯하여 문무관의 관복, 외국 사신에 대한 하사품, 관리의 봉급 대용 등 다방면으로 견직물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그 때문에 명조는 국가 수요에 공급하기 위하여 각지에 직속 관영 공장을 설치하고 고급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쑤저우를 중심으로 후저우(湖州), 자싱(佳興), 항저우 등의 도시에 고급 견직업이 성행하여 도시가 크게 번성하였다. 한편 정통 원년(1436)부터 관료의 봉급을 은으로 지급하게 되고 더불어 화페경제로 돌입하자 관료들이 비단의 소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명 중기 이후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평민들 사이에도 견직물이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
강남 도시 중 견직업이 가장 융성한 도시였던 쑤저우에는 집집마다 직기(織機)를 놓고 비단을 짜는 일이 허다하였다. 수십 대의 베틀을 놓고 많은 고용인을 두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집도 있었다. 명말, 쑤저우에는 ‘기호(機戶: 업주)’가 1만여 호나 있었다고 한다. 그 아래에는 염색 기술자, 무늬를 넣거나 글자를 넣는 기술자, 광택을 내는 기술자 등 각기 전문 기능을 가진 직공이 있어, 기호로부터 일당을 받고 노동에 임하였다. 특정의 기호를 얻지 못한 기능인들은 매일 새벽에 일정한 장소, 이른바 일용 노동시장에 나가 서성거리면서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성립과 고용노동의 출현, 계약관계의 성립 등은 명말 청초 ‘자본주의 맹아’의 단서를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쑤저우에서는 견직물 외에 무명이나 면직물 등의 방직업도 성행하였다. 물론 무명 생산의 중심은 쑹장(松江)이었으나 무명에 광택을 내는 작업은 대부분 쑤저우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농촌 수공업의 발달
15세기에는 쑤저우 부근의 농촌지역에도 견직업이 발달하였다. 명대 대토지 소유가 발전하여 중기 이후 소작농이 늘어났는데, 소농민들이 어려운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으로 농촌 가내 수공업을 경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서민의 지위가 상승되고, 고급품이 아닌 비교적 질이 낮은 명주를 일반 대중이 널리 사용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농가 가내 부업으로서 양잠과 견직업이 급격히 성행하였다.
명대에는 서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서민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을 비롯한 여러 도서들이 널리 유행하였다. 유명한 소설 중의 하나인 「성세항언(盛世恒言)」이라는 소설 가운데, “쑤저우 시내에서 70여 리 떨어진 곳에 성택진(盛澤鎭)이 있다. 이곳에는 민가가 많이 늘어져 있고 인심도 순박한데, 대게 견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도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 짜는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다. 거리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 천 백여 채의 건물은 모두 비단 파는 도매 상가로,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비단을 짜서 이곳으로 가져온다. 사방에서 비단을 팔고 사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것과 같다. 가경제(嘉慶帝) 때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처와 함께 집에서 베 짜는 기계를 놓고 매년 몇 상자의 누에를 키워 비단을 짜서 시장에 내다가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짠 비단을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 팔았다. 그러나 부자들은 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짜놓은 비단을 집에 그득 쌓아 놓으면, 도매업자가 상인을 데리고 와서 사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도 없고 비단도 그렇게 많지 않아 직접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았다.” 고 하여 쑤저우 주변 농촌 도시의 견직물 생산과 판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명 중기 이후 화폐경제가 농촌에 침투함에 따라 도시 주변의 농촌은 수공업 지역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들 농촌지역에 점점 인구가 증가하여 중소도시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초 50~60여 호에 불과했던 성택진도 15세기 후반에는 상인 등 주민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6세기 중엽에는 수백 호로 증가하였고, 면업이나 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업 도시가 되었다.
그 결과 명대의 쑤저우 거리는 물론 교회의 촌락에도 누에치기와 견직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쑤저우는 강남지방, 아니 중국 전체를 통해 보아도 최대의 직물 생산지로서 크게 발전하였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대량 수출되었다.
미곡 생산지의 중심 이동
명 중기 쑤저우는 이미 수십만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도시민의 식량, 특히 쌀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쑤저우를 중심으로 한 일대 농촌 지역에서는 벼를 재배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목면을 재배하고 뽕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았다. 견직업이 성행하고 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 주변 농경지는 뽕나무 밭이나 공장 지대로 변모하였고, 상품 생산의 전개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는 더욱 증가하였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강남 지방이 상업과 직물 수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할수록 강남의 미곡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쑤저우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 필요한 쌀은 창장 중류, 상류의 후베이(湖北)나 후난(湖南)지방에서 창장(長江)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왔다. 명 중기 이후, 동정호(洞庭湖)를 중심으호 한 후베이, 후난 지방의 수리 시설의 개발과 개간 사업, 농업 생산기술과 농기구의 개선 등으로 농업 생산이 높아졌고, 강남의 미곡 수요는 이 지역의 개발을 더욱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동정호를 끼고 있는 후베이와 후난, 즉 후광(湖廣)지방이 명 중기 이후 미곡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곡창지인 강남은 상공업 지역으로 변하고, 대신 후광지방이 중국의 곡창지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명 중기 이후 “湖廣熟 天下足(후베이와 후난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라는 속언이 생긴 것은 바로 곡창지대가 장쑤 ∙ 저장에서 후광지방으로 옮겨졌음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맹아
명 중기 이후 쑤저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품생산의 전개와 산업발전은 1950년대 이래 중국학자들에 의해 집중으로 연구되어,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라는 일대 논쟁으로 중요 테마가 되었다. 이것은 식민사관에 의한 중국 사회의 정체론을 극복하고, 중국 역사 속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였음을 밝히려는 작업이었다. 곧 중국 근대의 개시는 단순히 유럽 자본주의 일방적인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16~17세기(명말 청초)에 이미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자본주의 싹이 내재하고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로 쑤저우의 견직업, 쑹장의 면직업, 징더전(景德鎭)의 도자기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 자본주의 맹아의 지표로, 상품 생산자가 상품생산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고용노동이 출현하였으며,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생산자가 분화되고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들고 있다. 특히 쑤저우 지방은 상품 생산 뿐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장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명말 쑤저우에서 일어난 민변(民變: 도시민의 데모)이다. 상세를 징수하기 위해 파견된 환관 손륭의 횡포에 항거하여 일으킨 ‘직용의 변’(1601), 퇴직 관료인 주순창을 체포하러 온 관리가 쑤저우의 찰원(察院)에서 체포 사령장을 펴 낭독하는 ‘개독(開讀)’ 의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만여 명의 민중이 주순창의 체포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항의한 ‘개독의 사건’ 등은 상품 생산의 발전에 수반하여 형성된 쑤저우 도시민의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사회 모순 해결 운동’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맹아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한 자본주의 싹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례의 제시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중국 사회의 어떠한 역사적 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생겼고, 어떠한 구조(사뢰 ∙ 시장)를 위해 존재하였으며,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사상, 그리고 사회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해명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전순동 | 충북대 역사교육과(중국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