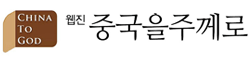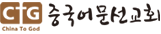책 제목만 보고 중국인들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뭐가 시끄럽다고 그래? 우린 평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또 책 제목만 보면 중국인의 민족성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아니다. 제목과 관련 있는 이야기도 실려 있긴 하나, 궁극적으로 이 책은 중국 여행기다. 다른 중국 관련 여행서적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자가 중국, 중국인의 민낯과 속살을 더 많이 그려준 것이다.
해외 여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이다. 이 책의 저자는 건축공학 전공자이자 실내공간 디자이너이다. 이곳에 실린 글들은 저자 혼자서 중국 여러 도시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스케치했다. 글과 그림, 사진이 적절하게 편집되었다.
저자가 발을 디딘 곳은 꽤 여러 곳이다. 충칭(重庆), 청두(成都),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난징(南京), 마카오(澳門),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 뤄양(洛陽), 시안(西安), 홍콩(香港) 등이다. 저자의 발길을 눈으로 좇아가는 길이 흥미롭다. 건축 전공자답게 건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글을 남겼다.
저자가 중국행을 결심한 것은 중국을 알고 싶었던 막연한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지적에 나 역시 공감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이다.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 대상 국가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역사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제를 풀어나갔다. 자신은 중국의 고도(古都)를 다녀보기 전에 중국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바라본 중국 이야기라고 한다. 여행기라기보다는 관찰기에 가깝고, 정치적 판세나 경제적·실질적 효용과 무관하게, 평범한 거리, 낡은 택시, 황제마사지, 허름한 식당 등을 살펴본 기록이다. 아울러 저자는 중국어를 전혀 못 한다.
난징(南京) 난징은 상처받은 도시이다. 난징을 가보지 않았어도 ‘난징대학살’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난징이라는 이름은 강렬하면서도 슬프다. 남쪽의 수도, 그러나 천하통일을 꿈꾸었던 이들에게 수도는 둘일 수 없었다.” 집권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곳저곳에 세워졌던 도시 중 최후까지 남아 있던 수도(京)는 베이징과 난징이다. 난징이라는 이름은 권력을 상실한 채 얻은 명예의 표식이다.
1937년 난징에서는 3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일본의 극우파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떼지만…). 8만 명의 여자가 강간당했다.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지켜 냈다. 여행지에서 저자의 관심은 고도의 과거와 오늘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그 지역의 고지도를 다운로드받는다. 책에도 고지도가 여럿 소개된다. 난징의 옛 궁궐터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중국의 옛 도시들은 줄곧 평지 위에 네모반듯한 도로 구조를 두고 중앙에 궁궐이 있는 베이징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징 성벽의 형태는 입체파 그림처럼 춤추며 흘렀고 옛 궁궐은 동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난징학살기념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기념이 꼭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나 보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일본어 안내판을 만났다. 같이 기억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념’이라는 단어는 뭔가 좋았던 일들에 붙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살기념관이니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이 명치에 뭐가 걸리는 듯 불편하다. 기념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록’이 더 낫지 않을까?) 난징에도 유적지가 많은 편인데 유적지 쪽으로는 인파가 적어 한산했다고 한다. 모든 이들이 학살기념관에 와 있었다. 중국인들은 이곳을 거쳐 난징 정부 청사와 쑨원의 묘 등을 순례하는 코스를 선호한다.
시안(西安) 시안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다. 서역인들이 많이 눈에 띈다. “20세기 후반의 개발은 땅속에 남아 있는 수많은 것들을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넓은 영역을 무수히 많은 콘크리트 건물로 채웠다. 꽉 들어찬 도시는 베이징처럼 거대했고 걷기가 쉽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중국에 가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이 시안이다. 진시황의 병마용 참호들을 꼭 보고 싶다. 아마 현재까지 발굴된 것도 땅속에 묻혀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이지 않을까? 더 어마어마한 것이 묻혀 있지 않을까? 그 유물들은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 할까?
책 제목에서 암시하는 ‘목소리’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저자는 중국인들의 큰 목소리에 관대하다.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큰 걸 잘 견디지 못한다.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다. 1할 정도의 사람만이 무척 시끄러웠다. 심지어 그조차도 중국에서 겪으니 여행지의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저자는 중국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울에서 도쿄로 날아간 적도 있다. 저자는 이 코스를 극동아시아의 황금루트라고 이름 붙인다. 세 도시는 서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이 얽히고설켜 있다. 이 세 도시의 특징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흥미롭다.
□ 도쿄에는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많고 베이징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많다. 서울에는 바지를 입은 여자가 많다. □ 서울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많고 베이징에는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가 많다. 도쿄에는 젊은 남자가 없다. □ 지하철 순환선인 서울의 2호선과 도쿄의 야마노테선, 베이징의 10호선은 모두 번잡하고,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 도쿄에는 쓰레기통이 많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베이징에는 쓰레기통이 많지만 쓰레기는 자유롭게 버린다. 서울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나는 경기도에 산다. 최근 집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이 사라졌다). □ 일반적으로 도쿄의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한·중·일·영 4개 언어가 표기된다. 서울의 안내판에는 한·중·영 3개 언어가 표기된다. 베이징의 안내판에는 중국어 외에 영어가 표기되어 있으면 다행이다. □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무시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중국인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싫어하지만 사실 크게 관심 없다. □ 한국인은 중국인을 무시하고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관심받는 것을 즐긴다(그런가? 겉으로 드러내면서 관심받는 것을 즐기는가?).
변성래 | 중국을 알고 싶은 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