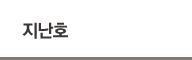머리 모양이나 복장은 민족이나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것들은 권력자의 지배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정복민족이 한족을 지배할 때에 자신들의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강요하는 예가 많았는데,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던 청대에는 변발과 치파오를 강요하면서 중국을 지배하였다.
변발의 역사
변발이라면 청조의 풍속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예는 일찍이 흉노족에서도 보인다. 고문헌에 의하면 흉노가 ‘피발(被髮)’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를 땋아 뒤로 내려뜨린 것을 말한다. 보통 야만인은 머리털을 풀어헤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흉노족은 머리를 땋은 것이다. ‘피발’은 후에 ‘편발(編髮, 머리를 엮어 맴)’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편(編)’자는 ‘변(辫)’과 같은 의미로 통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중국사에서 보면, 변발은 흉노 외에 선비, 돌궐, 여진, 몽골 민족에서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유목민족 고유의 풍습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칼을 쓰면서 상무적인 기질을 가진 민족이 대체로 변발 풍습을 지니고 있는데, 몽골, 만주, 일본 등이 그런 예에 속하는 것이다.
‘변발’은 뒤로 머리를 땋았다 하여 ‘치발(雉髮)’이라고도 칭한다. 영어로는 ‘pig tail’로 표기하는데, 그 모양이 ‘돼지 꼬리 같다’하여 나온 말일 것이다. 변발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몽고족과 만주족의 변발이다. 특히 만주족은 남자가 12, 13세가 되면 후두부(後頭部)만 남겨놓고 앞머리의 머리카락을 깎아버리고, 남은 후두부의 모발은 길게 길러서 3가닥으로 땋아 등 뒤로 늘어뜨렸던 것이다.
변발의 강제와 저항
1643년 청 태종 황태극(皇太極)가 51세의 나이로 죽자, 그 뒤를 이어 어린 아들 복림(福臨)이 제위에 올라 세조가(順治帝)가 되었다. 1645년, 그는 중국을 점령하여 수도를 북경(北京)으로 정하였다. 태종의 동생이요 그의 숙부가 되는 예친왕(睿親王) 도르곤(多爾袞, Dorgon, 1612~1650)이 세조의 정치를 섭정하였는데, 청군을 이끌고 북경에 입성한 도르곤은 다른 모든 명나라의 유습은 존중하여 그대로 두었으나, 머리 모양과 복장만은 만주족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이 때 발한 것이 ‘체두변발령(剃頭辨髮令, 또는 雉髮令)’이다. 머리 모양으로 청에 순복여부를 가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저항은 거세었다. 반발이 거세어지자 일시 보류하기도 했지만, 강남 지방을 거의 평정한 후, 다시 변발령을 내렸다. 전국 각지에 “유두불류발, 유발불류두(留頭不留髮, 留髮不留頭)”라 하여, ‘머리(頭)’를 남기는 자는 ‘머리카락(髮)’을 남기지 않고, ‘머리카락(髮)’을 남기는 자는 ‘머리(頭)’를 남기지 않는다.‘는 포고문을 내려 만주식 머리모양을 철저히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 하여 우리의 몸과 털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상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변발령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강남 지식인들의 저항이 강하였다 ‘오랑캐 머리’를 할 수 없다고 버틴 것이다. 당시 약 10여 년 동안 강남지방에 체제하며 전도하던 예수회의 선교사 마르티니(Martin Martini, 1643-61)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청군이 한인에 변발을 강요하자 일체의 한인은 모두 무기를 들고 일어나 국가를 위해 싸울 때나 황제를 위해 싸울 때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머리털 보호를 위하여 신명을 다해 청군에 저항하여 그들을 격퇴시켰다. 아마도 마음만 먹었다면 수도까지 탈환할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자기들 머리에 머리카락이 안전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승리를 바라지는 않았다.”라고 당시의 저항 실황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은 이러한 반항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오랑캐 풍속이라며 오랫동안 경멸해 오던 변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이후로 변발은 일반적인 풍속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나라 말에는 오히려 변발을 지키려고 했다. 그 후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때 단발령을 내림으로써 변발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당시 ‘변발 폐지령'이 내리자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머리 스타일을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사이에 변발에 익숙해지고 일반적으로 풍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발이 폐지될 때도 애를 먹었던 것이다.
복장은 시대를 반영하고
복장은 민족이나 시대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분을 표시하면서 권력자의 지배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정복 왕조는 한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모양과 복식을 강요하였는데, 청대의 널리 유행한 것은 변발과 치파오다.
복식은 시대와 사회상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흔히 ‘치마의 길이는 경기(景氣)와 밀접하다’는 치마 길이와 경제의 상관관계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데즈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는 그의 저서『 맨 워칭(Man Watching)』에서,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미니스커트가, 불황일 때는 옷감 값이 떨어져서 감이 많이 드는 긴 치마가 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복식도 사회·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발달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타지방과의 교류, 이민족 문화의 유입·동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목이 긴 신발, 폭이 좁은 소매와 바지, 변발 등은 북방 유목 민족의 복식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아주 먼 옛날 중국인의 조상들은 다른 지역의 원시인들이 그러하듯이 나뭇잎이나 짐승의 가죽이나 털로 몸을 가렸다. 이 시기 옷의 기능은 추위를 막고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전설상의 인물이며 중국인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黃帝)시대, 그리고 그 이후 요·순(堯·舜) 시기에 이미 장중하고 엄숙한 의복이 출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이들이 입었던 옷은 이미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이때부터 중국인의 복장은 관복(官服)과 민간복, 두 종류의 복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주대(周代, B.C 1100-221)에 이르러 봉건제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 신분이 분화되어 가자, 국가적으로 존비귀천의 벼슬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종류로 옷, 곧 예복(禮服)과 연복(燕服)이 출현하는데, 예복은 관리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예절에 맞추어서 입는 복장이고, 연복은 연거(燕居), 곧 집안에서 편안하게 입는 복장을 말한다.
유교주의가 발달한 한대(漢代, B.C 202-A.D 220)에는 복장에 관한 규범과 제도는 더욱 세분화되고 엄격해졌다. 관리들의 복장은 제례복(祭禮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연복(燕服) 등 네 종류로 나뉘었다. 제례복이란 제사 때에 입는 옷이고, 조복은 황제를 알현할 때 착용하는 복장이고, 관복은 관청에서 업무할 때 입는 복장이며, 연복은 앞에서 말했듯이 평상복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당·송·원·명대에 걸쳐 의관이 발달하고, 이것은 관직, 신분, 계절, 장소 등 각기 상황에 따라 달랐다. 그 구별은 주로 재료, 색깔, 무늬 및 동시에 부착되는 장식품으로 구별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자에 드리운 줄의 수로 등급을 구별하기도 하고, 혹은 복장의 질의 우열과 도안의 형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 등급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관직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신분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이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상층 사회 남자들의 상의는 넓은 소매를 가진 긴 일직선의 스타일의 옷이고, 허리에는 요대(腰帶)를 찼으며, 요대에는 각자의 신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향기가 배어나는 자그마한 장식물을 달았다. 하의로는 넓은 허리 넓적한 바지통에 발 부분을 묶게 되어 있는 바지를 입었다. 의복의 재료로는 주로 비단을 썼으며, 중국 관리들이 입던 관복에도 각양각색의 수가 놓여져 있었다. 황제나 황후는 용과 봉황을, 대신의 관복에는 산수(山水)나 각종 동물들을 수놓아 문무의 신분과 등급을 나타내었다.
중국 전통 의상의 또 다른 특징은 옷에다 수를 놓는 것이다. 특히 여인과 아이들의 옷에는 수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자가 출가할 때 혼수로 사용되는 옷이나 손수건 혹은 신발 등에 수가 놓여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여자들은 수를 잘 놓아야 인정을 받았다.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 중국에는 자수로 유명한 지역과 제품들이 있는데, 절강성 일대의 소수(蘇繡), 호남성, 광동성 일대의 상수(湘繡) 등이 특히 유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통의상으로 자리 잡은 치파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강제(强制)한 것이 만주복장이다. 만주족은 동북지방의 산림에서 수렵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기마와 활쏘기에 능한 민족이다. 초기의 만주복장은 수렵생활의 필요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은 앞이 트인 마제수(馬蹄袖)를 한 상의를 입었다. 소매가 가늘고 소매 끝이 손등을 덮어 활을 사용하는데 편리한 옷인데, 명대의 풍성한 파오(袍)와는 그 모습이 대조적이다.
여성의 복장은 길고 넉넉한 창파오(長袍)로, 길이는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길고 소매는 곧고 큰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만주복장을 ‘치파오’라고 한다. 청조는 팔기제(八旗制)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만주인을 치런(旗人)’이라 칭하였는데, ‘치런에 속한 여인들이 입는 파오(袍)’라는 데서 ‘치파오’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이다.
한족은 청조의 호복 강요, 곧 만주풍 복장 강요에 변발보다 쉽게 순응하였다. 민간 사회에 “生降死不降”(살아서는 따라도 죽어서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속언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인들이 청조의 만주 복장 강요에 대한 태도를 잘 말해주는 것으로, 생전에는 청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죽은 사람은 명나라 수의를 입는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종교상의 도사의 복장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은 한문화 전통을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남항여불항(男降女不降)’이라는 말이 있다. ‘남자는 따르나 여자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한족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청의 호복 강요에 항복하지만, 한족의 부녀자는 어디까지나 명대의 복장인 상의와 치마를 착용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청대 초기 부녀자의 복식은 남자와 달리 명대의 복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부녀자들도 청대 복식의 특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청대 부녀복식 중 특색 있는 것으로 치파오(旗袍)를 들 수 있다. 치파오는 크기가 넉넉하고 허리는 평평하며 곧고, 길이는 길어 발끝까지 이른다. 모두 수를 놓았으며, 옷깃은 우측으로 여몄다.
그렇지만 치파오는 점차 청대 말기 외래문명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개량되어 갔다. 즉, 경령은 높아질 때는 뺨을 덥기도 하고 낮아질 때는 없애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목에 꼭 끼고, 곡선은 허리와 둔부를 그대로 드러내도록 고안되었으며, 소매 또한 짧아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곡선미를 드러냈다. 이러한 곡선미의 등장은 중국부녀복식사상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제껏 가슴, 어깨, 허리 등이 모두 평직의 상태를 유지하던 복식이었는데, 처음으로 밀착된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중국부녀의 예복으로 자리하고 있다. 옆을 타는 길이가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했으나, 보통 엉덩이 아래부터 양 옆선이 발목 아래까지 터져 있다. 보통 손을 내린 부분을 중심으로 젊은 층은 조금 위로, 장년층은 조금 아래로 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치파오는 만주족 처녀들과 귀부인들이 즐겨 입던 옷인데, 전 세계 전통 의상 가운데 가장 섹시하다는 평을 받으며 오늘날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
1972년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베이징을 방문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영부인 패트 여사에게 외신 기자들이 치파오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치파오를 보고 중국 인구가 이처럼 많은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답했다는데, 이것은 그만큼 치파오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며 또 관능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전통식 복장을 대신하여 서양식 복장을 입기 시작한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였다. 당시 연해지역에 있던 서양 제국의 반식민지 지역, 예를 들면 홍콩이나 광주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서양인을 모방한 복장을 입기 시작하였다. 청나라가 멸망하자 변발을 잘라낸 후 어떠한 복장을 입을 것인가가 제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서양 복장 만능론을 내세웠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 복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사회는 서양식과 만주족 방식의 복장과 한족의 전통 복장 등이 한데 어우러져 온갖 스타일의 복장이 출현하였다. 만주족 여성들이 즐겨 입던 옆이 터진 치마인 치파오, 청나라 관리들이 착용하던 복장, 중국 전통의 긴 두루마기인 장삼(長衫), 목을 받쳐주는 칼라가 특징적인 마괘(馬褂), 현대적인 감각의 양복 등 동서고금의 각종 복장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의 전통의상인 한국의 한복이나 일본의 기모노처럼, 치파오는 중국의 전통의상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300년 가까이 지배하여 온 청조는 그간 중국인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청말 단발령이 나오자 이제는 변발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단발을 거부하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친숙해진 만주풍의 치파오는 중국인의 민족의상으로 정착되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전순동/ 충북대 역사교육과(중국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