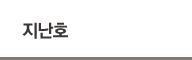단순한 칼싸움이 아닌 무협영화
「와호장룡」은 꽤나 눈길을 끄는 영화이다. 무협의 장르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고도(古都) 베이징(北京), 모래로 뒤덮인 고비사막과 끝없이 펼쳐진 평원,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눈 덮인 산봉우리와 빙하의 계속을 보여준다. 베이징에서는 유구한 중국 문명의 흔적들이 배어나오고, 광대한 자연의 모습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가를 느낄 수 있다.
「와호장룡」의 무술은 관객에게 상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격투 중에 지붕 위를 훨훨 날아다니고, 높은 담장을 수직으로 뛰어 오르며, 호수 위를 치솟아 하늘로 오르는 경쾌함이 돋보인다. 마치 한바탕의 춤사위를 보는 듯하다. 특히 황산(黃山)의 죽림에서 리무바이[李慕白: 저우룬파(周潤發) 분]와 위챠오롱[(玉嬌龍: 장쯔이(章子怡) 분]이 펼치는 격투는 발레를 연상케 한다. 대나무 가지의 반동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오르고 내리며 칼을 휘두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칼날 같은 대나무 잎 새의 뾰족한 형상과 함께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위챠오룡과 뤄샤오후[(羅小虎: 장전(張震) 분]가 신장(新疆)의 대평원에서 거침없이 말을 달리며 벌이는 격투 역시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배경음악도 이채롭다. 격투의 장면에서는 북소리가 울리고, 등장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현(弦) 소리가 은은하게 깔린다. 북소리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선동적이며, 현 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애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분고실든 현소리든 모두 중국의 고유한 가락을 담아낸다.
「와호장룡」의 감독은 리안(李安)이다. 그는 타이완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뉴욕대학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부터 단편영화로 이름을 날린 그는 장편 데뷔작인 「쿵후선생」, 「결혼피로연」, 「음식남녀」 등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개인과 가족, 현대화 전통,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경쾌한 터치로 그려냈다. 이로 인해 리안은 베를린영화제에서 금곰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헐리우드에서 만든 「센스, 센스빌리티」로 베를린영화제에서 다시 한 번 금곰상을 수상하였다. 헐리우드에서 두 번째로 만든 영화 「아이스 스톰」은 칸영화제 대상 후보네 오르기도 했다.
리안이 「와호장룡」을 찍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1950년 말부터 30년 이상 세계를 풍미했던 중국 무협영화는 이제 그 본산지인 홍콩에서조차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전혀 새로운 형식의 무협영화를 만들어냈다.
타임지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 영화에 대해 크게 호평하였다. 이란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무술영화는 즐거리감독 따로 무술감독 따로였다. 별도의 두 영화가 한 작품에 들어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줄거리와 무술 모두에 일관된 분위기와 개념을 유지하려고애를 썼다. 격투장면마다 의미는 물론,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갈등을 부여했다.” 리안은 또한 5개월에 걸친 중국 대륙 현지촬영에서 중국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담아내었다.
보검과 사랑에 얽힌 이야기
「와호장룡」의 줄거리는 1930년대 왕뚜뤼(王度盧)의 역사대하소설 「테치인핑(鐵騎銀甁)」의 일부에서 따온 것이다. 이 소설은 1991년 「청강만리(淸江萬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박강수 역, 고려원 간). 영화 「와호장룡」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말, ‘우당파(武當派)’의 고수 리무바이는 무림의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우당’에 전해오던 보검 ‘청명검’을 베이징에 있는 테빼이러[(鐵貝勒: 랑슝(郞)雄) 분]에게 보내기로 한다. 리무바이는 자신이 연모하는 위슈렌[(兪秀蓮: 양쯔칭(楊紫琼) 분]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그리고 신변을 정리한 뒤에 그녀와 베이징에서 합류하기로 한다. 청명검은 테빼이러에게 무사히 전달되나 북면을 한 검객에 의해 도난을 당한다.
베이징에 도착한 리무바이는 위슈렌과 함께 청명검을 찾아나서고, 결국 고관의 딸 위챠오롱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위챠오롱은 삐옌후리(碧眼狐狸: 쩡페이페이(鄭佩佩) 분]에게서 무술을 배웠는데, 이 삐옌후리는 바로 리무바이의 스승을 독침으로 죽이고 ‘우당’의 비전(秘傳)을 훔쳐간 여인이었다. 리무바이는 삐옌후리를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리무바이는 위챠롱에게 진정한 무술을 배우도록 설득 하지만 위챠오롱은 이를 거절한다.
위챠오롱은 예전에 신장의 관리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신장으로 가던 중 뤄샤오후가 이끄는 마적단의 습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우여곡적 끝에 위챠오롱은 뤄샤오후와 사랑에 빠지고 대평원에서 함께 지낸다. 얼마 후 위챠오롱은 부모에게 되돌아가고 부친이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자 함께 떠난다.
위챠오롱은 부모의 강요로 고관의 아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뤄샤오후는 위험을 무릎 쓰고 그녀를 찾아와 함께 신장으로 가자고 애원한다. 그러나 위챠오롱은 이를 거절한다. 위챠오롱의 결혼식 날, 뤄사오후가 나타나 아수라장을 만든다. 위챠오롱은 집을 떠나 강호의 무인으로 살기로 한다. 뤄샤오후는 리무바이의 도움으로 우당파의 본거지인 우당산으로 피신한다.
마침내 리무바이와 삐옌후리 간에 격투가 벌어지고 삐옌후리는 싸움에 져서 죽는다. 그러나 삐옌후리가 쏜 독침으로 인해 리무바이도 위슈롄의 품에 안겨 죽어간다. 리무바이는 쉬슈롄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위챠오롱은 우당산으로 가서 뤄샤오후를 만나지만, 결국 산 아래로 자신의 몸을 날린다.
피보다 사랑의 감성이 돋보여
이 영화의 중심테마는 복수혈전이 아니다. 리무바이가 자신의 스승을 죽인 삐옌후리를 죽여 원수를 갚긴 하지만, 이것은 결코 리무바이의 무공보다는 위챠오롱과 위슈롄의 무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거기다 무예가 뛰어난 삐옌후리 역시 여성이어서 남성 중심의 다른 무협영화에 비해 다분히 여성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잔인함이나 비장함보다 여유 있는 긴장감과 경쾌함이 돋보인다.
이 영화의 중심축에는 두 쌍의 연인이 있다. 리무바이와 쉬슈롄, 차오롱과 뤄샤오후가 그들이다. 이들의 사랑은 아주 다른 빛깔을 가진다. 리무바이와 위슈롄의 사랑이 은근하면서도 정제된 빛깔이라면, 위챠오롱과 뤄샤오후의 사랑은 열정적이면서 튀는 빛깔이다. 한 편의 영화에 이 두 가지 빛깔이 교직되면서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
위슈롄에게는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는 리무바이를 살리려다 희생되었다. 위슈롄과 리무바이는 서로 사모하면서도 죽은 이에 대한 의리 때문에 가슴에 묻어두고 있을 뿐이다. 리무바이는 강호를 떠나면서 위슈롄에게 이렇게 말한다.
“갑자기 사방이 침묵으로 뒤덮였소.”
“드디어 도를 깨치셨군요.”
“아니오, 그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고.”
그는 우당파에서 최고의 무예를 지니게 되었지만, 위슈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져 강호를 떠나게 된 것이다.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야 리무바이는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을 사랑해왔소. 나의 혼백은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내 혼백은 외롭지 않을 거요.”
비록 죽음이 둘을 갈라놓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위챠오롱은 마적단의 두목 뤄샤오후에 대해 처음엔 적대감을 가졌지만, 뤄샤오후의 순수한 마음과 배려를 통해 마음이 열린다. 그 뒤 두 사람은 아무런 격식도 없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사랑은 야생화처럼 자연 속에서 익어간다. 그러나 후일 위챠오롱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보지 못한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위챠오롱에게 뤄샤오후의 사랑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뤄샤오후와 위챠오롱 두 인물은 혼전관계를 쉽게 맺는 현대인의 생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현대 여성들의 해방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위챠오롱의 자살을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처럼 미화한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리무바이의 말 한 마디,
“손을 꼭 쥐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지만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끌어안고 사느라 진정한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역설이다.
이홍자 | 문학박사, 중구선교훈련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