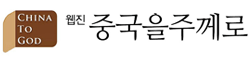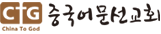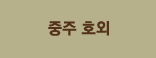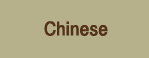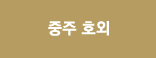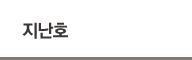부산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릴 때였다. 내 뒤에 선 나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단발에 금속 핀으로 멋을 낸 30대의 한국 여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뾰족한 구두 끝으로 내 구두 뒤축을 톡톡 차면서 뒤따르더니, 드디어 테가 약간 도드라져 나온 내 구두의 신창을 두 번이나 꽉 밟았다.
나는 꽤 사나운 눈길로 돌아보았는데 그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쪽만 보고 있었다. 중국 같으면 “왜 남의 발을 밟고도 모른 척하는 거에요?” 하든가, “좀 똑똑히 보고 걸으세요.” 할 터이지만, 나는 우리말로 도저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더욱이 이런 경우 한국사람한테는 뭐라고 꾸짖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꾹 참고 비행기에서 내려 구두 뒤축을 내려다보니 신창이 5분의 1 가량은 떨어져 있었다. 중국에서 밟히지 않던 신창이 하필이면 한국에 와서 밟혀 떨어지다니, 그 여자가 밉고 화가 났다. 세관통과도 아직 안되었는데 떨어진 신을 신고 중국 조선족의 신분으로 한국 세관을 지나야 하는 것이 그렇게 기가 죽고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다.
세관에서는 무엇하러 왔느냐, 누구하고 왔느냐, 며칠 묵느냐 하고 묻다가 어느 호텔에 묵느냐 하는 것까지 물었다. 공식적인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어느 호텔에 묵느냐는 질문은 좀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중국 같으면 옆이 터진 헌 구두를 신고도 자신 있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련만, 한국 땅을 밟으면서 왜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드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구두가 떨어지면 한국사람도 때워 신을 텐데, 이전에 한국 왔을 때 구두 때우는 데를 못 봤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런 데를 한번도 못 봤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떨어진 구두를 신고 여행사 두 곳을 찾아가 일을 보고 이튿날 점심 때쯤 세 번째 여행사에서 나올 때였다. 나는 아주 반가운 간판을 발견했다. 길 옆 알루미늄 합금으로 지어진 자그마한 집 유리창에 ‘구두수선’이라는 글씨기 씌어 있었던 것이다.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오른쪽 식지 끝으로 두 가지 약을 열심히 구두에 칠하면서 반겨 맞아주었다. 나는 신창 때우는데 얼마를 받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고 신을 벗어 아저씨에게 건네주었다. 신을 때우는 김에 닦아서 신으라는 아저씨의 말에 신을 닦는 값이 얼마인지 궁금했지만 역시 묻지 않고 그러자고 했다.
내 구두를 때우고 닦고 남편의 구두도 닦았다. 너무 반들거려서 신을 신으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우리의 행색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던지 아저씨는 머뭇머뭇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국내인이 아니신지요?” 내가 히죽이 웃자 남편이 대뜸 대답했다. “중국에서 온 교포입니다.” “참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땐 값은 그만두고 4천 원만 주십시오. 중국사람은 처음인데요.” 아저씨는 반가워하면서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했다. 값이 비싼데도 남편은 지갑에서 5천 원짜리 한장을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면서 거스름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우리의 자존심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이 조심스레 물어오던 ‘구두수선’ 아저씨의 물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출처 / 『베이징저널』 1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