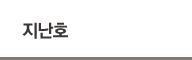중국기독교회사 최종.jpg)
양정균(楊廷筠, 1557∼1627)의 자는 중견(仲堅)이고, 호는 기원(淇園)으로 절강(浙江)성 인화(仁和; 지금의 항주) 사람이다. 양정균은 서광계(徐光啓, 1562∼1633), 이지조(李之藻, 1565∼1630) 등과 함께 중국 천주교의 3대 지주(支柱)로 추앙받고 있다.
양정균은 1584년(만력 12년) 거인(擧人)이 되었고, 1592년(만력 20년)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강서(江西)성 길안부(吉安府) 안복지현(安福知縣)에서 7년간 선정을 베풀었다. 1598년(만력 26년)에는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승진하였고, 광사세감(礦使稅監)으로 전횡을 하던 환관 진봉(陳奉), 마당(馬堂), 진증(陳增) 등의 횡포를 간언하는 용기를 보였다. 1602년(만력 30년) 이후 호광도어사(湖廣道御史) 등 지방관으로 재임하며 민생을 적극 돌보았다. 1609년(만력 37년)에는 어사로서 남직예의 학정의 임무를 수행할 때 명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의 정난(靖難) 즉위 조서를 거부하면서 건문제(建文帝)에 대한 충절을 지킨 방효유(方孝孺)의 후예를 찾아 구충서원(求忠書院)을 건립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난 양정균은 10여 년 동안 은거하다가 동림학파의 거두 추원표(鄒元標)의 천거를 받아 1622년(천계 2년)에 다시 하남안찰사(河南按察司) 부사(副使)로 임명되었다가 이후 광록시(光綠寺) 소경(少卿)과 순천부승(順天府丞)을 지낸 뒤 1624년(천계 4년) 환관 위충현(魏忠賢)을 피해 귀향하였고, 1627년에 세상을 떠났다.
1609년 관직에서 물러난 양정균은 불교에 강한 흥미를 느끼고 유명한 불교 신자나 승려들과 긴밀하게 교제하였다. 그러나 동향 친구인 이지조가 9년여의 신앙적 방황을 끝내고 1610년 3월 마침내 세례를 받아 개종한 사건은 양정균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양정균은 1602년 북경에서 여행 중이던 마테오 리치와 만난 이후 마테오 리치의 북경 사저로 찾아가면서 교제를 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1611년(만력 39년) 4월 부친상을 당한 이지조가 고향으로 오면서 서양선교사 라자레 카타네오(郭居靜, Lazare Kattaneo), 니콜라스 트리고(金尼閣, Nicolas Trigault)와 중국인 수사[敎士] 종명인(鐘鳴仁) 등과 동행하였는데, 양정균은 조문을 가서 이지조가 흙과 나무로 된 불상을 파괴한 것과 승려나 도사를 불러 장례를 진행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
양정균은 이후 선교사 카타네오와 트리고를 초청하여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천주교 교리를 이해한 뒤에 곧바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첩을 두고 있었기에 거절당하였다. 양정균은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여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지조는 바로 이 점이 천주교가 불교보다 훨씬 더 고상한 면모임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양정균은 첩을 내보내고 천주교가 금한 계율을 몸소 지켜나갔고, 1611년 6월 카타네오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미카엘(Michael, 彌格爾, 邁可)이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친구 사이였던 이지조와 양정균의 개종 과정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첫째, 개종 속도가 달랐다. 이지조의 개종은 마테오 리치와의 교제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졌으나 양정균의 개종은 만력 39년(1611) 4월 이지조 부친상 조문을 갔다가 선교사와 만나게 된 지 2개월 뒤인 6월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개종의 배경이 달랐다. 이지조는 서방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서방 종교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개종하게 되었으나, 양정균은 시종 신앙 자체에 대한 논증과 감동을 통해 개종이 이루어졌다. 양정균은 세례받고 천주교 신도가 된 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달라졌다. 그는 사람이 천지의 주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끊어지고 다른 것으로는 속죄받을 길이 없다고 믿었다.
양정균은 서유(西儒)가 바로 진(秦)대 이후 사라진 유가의 정통을 회복시켰다고 보았다. 그는 서학이 존재하므로 인해 비로소 천(天)을 말하고 주(主)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서 유가의 경전을 진실로 보완할 수 있으며, 도가와 불교를 비판함으로써 유교, 불교, 도교 등 삼교(三敎)의 허울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다. 양정균은 기본적으로 인륜(人伦) 도덕(道德) 영역과 그것의 사회적 실천이란 관점에서 실학을 숭상하고 공담(空談)을 반대했다. 그는 실학과 실용의 가치를 기독교 신앙에서 찾았는데, 십계명은 ‘하늘 공경과 사람 사랑(敬天愛人)’의 실천 덕목임을 강조했다.
양정균은 개인의 수양과 자성(自省)을 중시하였는데, 기독교의 서적 또한 자성과 참회 그리고 죄악의 억제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예수회 수도사의 자성 방식을 배운 대로 매일 아침, 정오, 저녁 세 차례 조용히 성경을 암송하며 자신의 생각, 말, 행위 등에 과오가 있는지 성찰했다. 불교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한 양정균에 대해 일부 불교 신도들이 불만을 품고 그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양정균은 천주교를 변론하는 저술을 집필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대의편(代疑篇)》, 《대의속편(代疑續篇)》, 《천석명변(天釋明辯)》, 《성수기언(聖水紀言)》과 《효란불병명설(鴞鸞不幷鳴說)》 등이 그것이다.
《천석명변》에서 양정균은 불교는 천학(天學)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논지를 자신의 불교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력하였다. 《효란불병명설》에서는 기독교가 비밀결사 백련교(白蓮敎) 등 사교(邪敎)와 동류라는 견해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담고 있는데, 천주교가 백련교 등 민간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과 정통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종교임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양정균은 《대의편》에서 불교가 일찍이 한 명제(明帝) 때에 중국에 전입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강하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불교의 전통에 정면 도전하고 서학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양정균의 평소 선행과 업적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유일한 잘못은 천주교로의 개종이라고 지적하자, 양정균은 자신이 평생에 선한 행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잘한 일은 천주교 성교(聖敎)를 따른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요컨대 양정균은 유가적 교양인으로서 관직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일생을 살았으며 한때 불교에 심취하였으나, 천주교로 개종한 이후에는 유학과 서학의 공통된 윤리와 보완적 영역을 깊이 인식한 바탕 위에 경세치용의 실학과 천주교 교리에 대한 충실한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명말 중국에서 천주교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사진설명 | 양정균 초상
사진출처 |바이두
김종건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