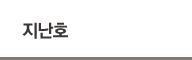KakaoTalk_20210203_165256709.jpg)
선교전략상의 긴장
마테오 리치의 적응성 선교 노선은 주로 중국의 실상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선교를 진행하면서 지식인들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선교전략, 즉 학술 교류에 기반을 둔 선교, 중국 전통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 서두르지 않으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평화적 선교전략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중국선교는 중국 선교단에서 수립한 전략만으로 전개될 수 없었고, 서방 기독교 세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여 그 영향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세계선교를 지향하던 유럽 각국은 군사적 정복과 정신적 귀의의 긴밀한 협조라는 선교 노선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동원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스페인의 천주교회는 멕시코 등 아메리카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교화시키는 선교전략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주로 멕시코 항로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진입한 각급 선교단은 기존의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과 선교사상, 선교정책, 선교 방법 등에서 차이와 갈등이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이 차이와 갈등의 연장선에서 추후 ‘의례 논쟁’으로 발전하여 ‘100년 금교’ 시대라는 심각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선교전략상의 주요 논쟁점은 아래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군사 정복과 정신 정복 연계, 즉 무력을 앞세워 즉각적으로 대규모 선교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 대신 온건하고 평화적인 선교 방침에 따라 학술 교류를 통해 서서히 중국의 교화를 도모할 것인가?
둘째, 현지 문명을 파괴하고 기독교로 바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문화 전통과 풍속에 존중하고 고유 문화의 완성을 도우면서 기독교의 지위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셋째, 기독교 교리 수용 여부를 제쳐 두고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개종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양적인 집단 개종 방식 대신 개종자의 교리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경건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류층 문인학사들을 중요한 개종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장래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것인가? 등이었다.
알폰소 산체스(Alphonso Sánchez, 桑切斯, 1545-1593) 신부를 비롯한 무장 정복 선교 주장은 다행하게도 중국선교를 감독하고 있던 예수회 인도교구 시찰원 발리냐노, 마카오 선교단장 카브랄(Cabral, 卡布拉爾), 루지에리 등이 적절히 차단함으로써, 중국에서 스페인 군대가 출동하여 중국 조정을 공격하는 상황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조직적으로 중국 선교단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호세 아코스타(José de Acosta, 阿科斯塔, 1539-1600) 신부의 무력 선교에 대한 반박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적응성 선교 노선과 일본선교
중국과 동일한 교구부성(敎區副省)에 속한 일본 예수회 선교단의 경우 비록 적응성 선교 노선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일본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추진된 선교 사업의 발전은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정치 형세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병폐를 초래하였다. 첫째, 너무나 쉽게 선교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을 무시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 습속에 적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둘째, 과학 지식을 수단으로 하는 우회적 선교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 기독교 교의를 전파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1570년에서 1582년 사이 일본 선교단의 책임자였던 프란시스코 카브랄(方濟各·卡布拉爾, Francisco Cabral, 1529-1609) 신부는 일본 풍속과 습관을 학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량 영세를 베풀어 교회의 외형을 확장하는 공격적 선교를 지향하였다. 이는 일본 정국의 동요와 더불어 교회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맞았다. 일본 선교단은 새로 정권을 장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1587년 여름,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을 떠나라는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발리냐노는 두 번째 일본에 머물던 시기(1590-1592), 일본에서의 공격적 선교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1594년 마카오에 일본선교를 위한 학원을 세우자는 청원을 하였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현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한 바탕 위에서 선교할 것을 강조하였고, 마카오에 일본선교를 위한 학원을 세워, 일본어와 일본 풍속과 습관을 익힌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선교에 공헌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선교 사업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1603년 에도 막부가 성립하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해외 무역을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기독교의 전파에 대해 관용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1605년 전체 일본의 기독교도는 약 75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 선교단은 바로 안일해졌고, 일본 문화에 적응하는 평화적인 선교 방침을 진지하게 유지 계승하지 않았다. 결국 기독교 전파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 에도 막부는 일본 기독교 선교에 대하여 점점 엄격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선교에 위기 상황이 예상되던 바로 그때, 중국 선교단은 마테오 리치의 노력에 힘입어 북경에 거점을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의 적응성 선교 노선에 대해 일본 선교단에서도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이 너무 늦어서, 결국 에도 막부는 1613년 12월에 전국 범위의 기독교 금지령을 선포하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하다가 처형당한 기독교도가 모두 28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선교단은 적응성 선교전략을 관철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않고 정치 지배 세력과의 연계에 몰두하다가 정국의 변화에 따른 부침(浮沈)을 겪게 되었고, 또한 해당 지역의 민속 문화에 적응하고 과학 지식을 전파하는 우회적 선교 방법에 대해 그 가치를 중시하여 실천하지 않다가 결국 선교 사업의 기반을 박탈당하는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
적응성 선교 노선과 인도 동남아선교
그러나 일본에서와는 달리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선교사들은 선교사상이나 책략과 방법에서 마테오 리치의 적응성 선교전략을 따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17세기 전반기 베트남의 통킹만과 안남(安南)지역에 몇몇 중요한 망교자(望敎者)센터가 신속하게 발전한 것은 바로 로데스(羅得斯, Alexandre de Rhodes, 1591–1660) 신부가 마테오 리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룩한 결과였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 지역에서 로데스 신부는 공개적으로 미신을 공격하며 시작하는 것보다 중국에서처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한 결과였다.
인도의 예수회 선교사 노빌리(羅伯特·德·諾比利, Roberto de Nobili, 1577–1656)가 전개한 인도 선교전략도 마테오 리치식 적응 혹은 타협의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605년 5월 20일, 노빌리는 인도 고아에 상륙한 뒤 마드라스로 들어가 선교하였다. 인도 내지 선교 사업이 몇 년이 지나도 거둔 효과가 미미하자, 노빌리는 선교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이후 인도 최상층 브라만 계급에 적응하는 책략을 추진하였고, 복장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브라만의 관습과 의례를 적극 받아들였다. 또 그 지역의 언어로 보다 정확하게 기독교 교리를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신학 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적응의 근거를 논증하였으며, 기독교 교도가 이교도의 복장을 입는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전략의 정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논문을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노빌리는 일본과 중국에 있는 예수회 선교사가 승려 복장을 한 것은 그 지역의 풍속을 따르는 방식을 취하여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귀의시킬 수 있었던 경험을 강조하였다. 노빌리는 이교도들 미신과 편견을 정면 공격하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이 원한과 박해와 완강한 저항을 초래하며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꼭꼭 닫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빌리가 마테오 리치의 책략을 채택하여 스스로 브라만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취한 성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1619년 고아 종교재판은 노빌리의 방법을 인정하였고, 일본과 중국에서와 같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 교도와 비교도의 혼인을 허용했다. 1623년, 아르마(阿爾馬)의 주교 베드로(彼得 倫巴德)는 마테오 리치의 선례에 따라 노빌리가 복장을 바꾼 것은 바른 것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비록 적응성 선교전략의 깊이와 넓이 방면에서는 노빌리가 마테오 리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가 이론적으로 ‘한화(漢化)’의 신학적 근거를 설명하여 입증함으로써 뒷날 마테오 리치의 선교 노선을 지키려던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적응성 선교 노선과 유럽에서의 반향
유럽에서도 마테오 리치의 선교 정신과 방식에 찬동하는 종교계 인사들이 없지 않았다. 아코스타(阿科斯塔, José de Acosta)와 산체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자, 무력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며 아코스타의 관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스페인에서 도미니크선교회 선교사 볼란테(沃蘭特, Juan Volante)와 프란시스코선교회 선교사 부르고스(布爾戈斯, Hieronymo Burgos)는 어떤 인위적 수단을 빌려서 선교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다. 선교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했다.
마테오 리치의 선교 사업은 또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고해사제(告解司祭)이자 저명한 예수회 선교사였던 고든(彼德 考頓)의 열렬한 관심과 칭찬을 받았다. 그는 1606년 8월 28일 총회장에게 쓴 편지에서, “마테오 리치는 인내, 성실, 열정, 천재적 노력을 총동원하여 중국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 속 사도들의 언행을 인용하여, 그가 이교도 가운데에서도 존재하는 선량, 정직, 성실 등 자연스러운 미덕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여 이교도 본연의 품성을 진정한 능력과 미덕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1)
마테오 리치의 적응성 선교 노선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미주
1) [法]裴化行 著, 管震湖 譯, 《利瑪竇評傳》 下冊, pp.569-570.
사진설명 | 마테오 리치의 적응성 선교전략을 채택한 예수회 인도 선교사 노빌리
사진출처 | 위키백과
김종건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