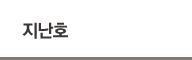지난 목차
서론
Ⅰ. 종교 문제
1. 종교에 대한 물음: 중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1) 감정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2) 초월의식을 종교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
3) 구원의 길로서의 과학
2. 기독교의 대안: 중국은 어떤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1) 신문화운동과 기독교
2)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문화운동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3) 새로운 종교(新宗敎)의 건설
<‘종교 문제’에 대한 당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논점>
<신종교 건립의 배경>
<신종교와 과학 사조의 관계>
<신종교와 민주 정신의 관계>
Ⅱ.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1. 근대 기독교 복음 메시지에서의 변화
2.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론(호교신학)의 등장
1) 예수의 인성(人性)과 그의 인격
Ⅱ.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2)
2) 예수의 신성(神性)과 그가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들
또 하나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는 예수가 행하였던 기적들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진독수(陳獨秀)는 처음에는 예수의 고귀한 인격에 감명을 받았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을 받아들여 공산당원이 된 뒤에는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하였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두 번째 글인 〈기독교와 기독교회(基督敎與中國敎會)〉에서 기독교의 신학 이론과 생활 실천, 양 방면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였다.1) 진독수는 예수의 생애에서 초자연적 기적들에 관하여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가 행한 기적들 그리고 부활 등은 모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박애와 희생과 화평 등의 미덕을 주장하지만 이들 일체는 국가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 하며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다. “오늘날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침략에 직면하여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맹목적인 박애와 희생은 오히려 죄악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2) 이러한 진독수의 생각은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그의 호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장역경(張亦鏡)은 그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다. 그는 과학적 방법(접근)과 역사적 방법(접근)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우리가 우리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마땅히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할 수 있다. 예수의 생애를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문제이며 그를 위해 정당한 것은 후자의 방법이다. 지나간 일들은 이미 발생한 것이요 고전들 속에서 일부 관련 기록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문헌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의 생애 사적들에 대해서도 당대의 역사가들이 그중 일부분을 기록해 두었다.3) 예를 들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고사(猶太古史, Jewish Antiquities)》라는 책 속에서 예수의 생애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증거하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의 현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도록 의도된 그의 기적들과 놀라운 행동들로 유명하였다. 그는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그 때에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기소된 법정에서 잘못 판단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계속 그를 따랐으며 그들 스스로 흩어지려 하지 않았다.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매장된 지 삼일 후에 그는 살아나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가 행한 경이로운 일들은 무수히 많았으며 그의 제자들은 많아져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4)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적 약속의 성취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 또한 위의 요세푸스의 글이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매장된 후 삼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며, 성경의 복음서들 또한 빈 무덤의 일과 예수가 사후에(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적 문헌상의 근거이며, 부활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다른 이론들이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장역경은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제자들과 부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단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근본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상하기를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결코 죽지 않았고 다만 질식하여 혼절한 상태였는데 후에 무덤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떠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나 장역경은 만약 그렇다면 그의 연약해지고 피 흘린 몸으로는 설사 무덤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영감과 동력을 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난 것은 생리학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선생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을 목도한 그의 제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설교함으로써 군중을 속이게 되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초기 교회의 박해자인 다소의 사울이 진리의 설교자 바울로 전향할 수 있었겠는가?6)
또한 장역경은 한편으로 보수적 신학 입장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호소함으로써 예수의 신성(神性)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예수의 강생(降生)은 일찍이 구약 선지 시대에 이미 예고된 것이며, 신약 복음서의 기록은 곧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이며, 성육신(成肉身)의 사실은 예수가 신성과 인성(人性) 두 본성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역경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기적 중 최대의 기적이며,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기적들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의 신성은 인성이 최고도로 발전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성의 연장인 것도 아니다. 신성과 인성의 구별은 본질상의 것이요 결코 정도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는 곧 완전한 신(神)이다. 장역경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당시 서방교회에서 형성된 자유주의(自由派)와 근본주의(基要派) 사이의 신학적 논쟁에 대해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전통 서구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곧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그의 한 몸에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기독교 인사들과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였다.
자유주의 교육을 받아 개방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기독교 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들 중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전통 신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는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예수는 다만 인성의 가장 완전한 표현(구현)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조직한 학술단체 중 하나였던 생명사(生命社)에 소속되었던 많은 지식인들과 연경(燕京)대학의 학자들 중 많은 이가 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품덕(品德)이었다. 중국청년협회(YMCA)의 지도적인 대변인이었던 호이곡(胡貽穀)7)은 예수에 대해 초기교회 내부의 문헌 이외에 외부의 비기독교 문헌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상 저명한 인물이라 하여 존경을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정녀 탄생을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였다. 그는 예수의 신성이 논쟁적 주제가 된 서기 2세기 이전까지는 어떤 고전(문헌)도 그 사건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는 의심을 품을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시에 성경 속에서 마가복음과 마리아의 말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서간들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질적으로 다른 본질상의 구별이 있지 않으며 양자는 연속적이다. ‘신’은 ‘인간’ 내면의 중요한 성분이며, 인간이 수양을 통해 도달한 지고한 경지가 곧 ‘신‘이다.8)
호이곡의 신학은 전통의 신관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신은 단순히 제일 원인 혹은 절대적인 일자, 우주의 궁극적 근원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역사와 사회·윤리적 영역에 관여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한 것처럼 자연계의 현상을 관찰하여 그 속에서 신의 자취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들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면에서 그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을 추구하고 정신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두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길이다. 인간이 노력하면 곧 신성의 소재(所在)를 발견할 수 있다. 호이곡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예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격과 감정을 가진 한 진실한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유대의 종교를 개혁하였으며 자신만의 참신한 각도로부터 그것들의 의미를 재해석해 냄으로써 율법과 예언들의 요구를 성취하였다. 예수에게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신의 특별한 소명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인생은 신성하고 순결한 사랑의 최상의 현현이었다. 그러한 미덕(美德)들이 그로 하여금 신과 동등한 존귀한 지위를 얻게 하였다.
조자신(趙紫宸)의 예수에 대한 해석도 그와 비슷한 곳이 있었다. 조자신은 유가(儒家)의 인본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인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관념(신학)에서는 인성과 신성을 명료하게 구분하였고 둘 사이에 본질상의 연계를 조금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자신은 연속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상의 예수는 인성 자체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가 나를 끌어당긴 부분은 결코 그가 신이라거나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데에 있지 않았다. 그가 나의 절실한 주의와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가 한 진실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인자(人子)라고 언명했을 때-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든지 간에- 나는 흥분을 느꼈다. 나는 그의 교훈이 진실한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다.9)
조자신은 일부 서양 사상가들의 신관(神觀)에 결코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과도하게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양된 의식 속에서 신과 만난다고 주장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신에 대해서는 계시 이외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칼 바르트(Karl Barth), 신비 체험을 주장한 루돌프 오토(Rudolf Otto), 고독 가운데서의 종교 활동을 주장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등등은 모두 유사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10) 그런 관점 때문에 사회에서의 수많은 문화 활동이 종교로부터 분리되고 말았다. 법과 정부, 문학과 과학, 철학과 정치 등등이 그것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현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호소력을 잃고 말았다. 조자신은 예수의 인성과 예수가 당시 사회와 가졌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의 의도는 기독교를 인생의 ‘다양한 영역들 중의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11) 사실상 이러한 신학적 논점은 그가 국가를 중건하는 계획에 참여하면서 취한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예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지고(至高)한 계시(啓示)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에 대한 앎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 외의 다른 이론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강생(降生), 성육신 등등은 모두 우리들이 예수의 진실한 인성, ‘신성 그 자체의 바로 그 내용’, 곧 신성의 본질인 예수의 온전한 인성을 파악하는 데 방해를 가져올 수 있다.12)
또한 서보겸(徐寶謙)의 기독론에서 예수의 독특성은 그의 도덕과 영적 수양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예수의 생애는 죄악이 없었으며 희생과 박애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의 종교 의식(意識)과 감정은 균등하게 그와 신 사이에 일종의 비상하게 밀접한 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초기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서보겸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신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라면, 혹은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서 어떠한 신적인 본질도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는 결코 나의 신이 아니다.”13) 그는 이러한 ‘신적인 본질’은 인간의 생명 중에서 점차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해 인간과 신의 관계 사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들은 예수의 족적을 따라 신을 인식하고 인간에게 봉사한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우리들 속에서 속히 실현될 것이다.14)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신은 더욱 더욱 가까워진다.’15) 서보겸의 신학 이론은 ‘봉사의 원칙(service motif)’을 십분 강조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오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그가 기독교의 전범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우 영향력 있는 기독교 학자로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또 한 사람이 오뢰천(吳雷川)이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주요한 이유는 예수의 생애를 본받음으로써 한 사람의 당당하고 올바른 중국인이 되기를 희망해서였다. 그는 기독교의 도움에 의지해서 중국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고 깊이 믿었다. 국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예수에 대한 그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은 두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예수는 처음에 평민 신분으로 나와서 전도하였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일대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한 뒤 그는 적지 않은 군중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말에 반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도자들의 인정을 얻는데 실패했으며 군중들에 의해서는 자주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6) 그는 또한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며 만약 신의 명령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개혁의 방법은 결코 당시 지도자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오뢰천은 예수의 사명감은 어떤 천상(天上)으로부터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환경의 시련(시험)을 거친 후 점차적으로 새롭게 체득해 간 것이었다.17)
그리스도에 대해 신성이 아니라 인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역사적 예수에 초점(강조)을 둔 것은 전통적 신학 관념과 구분되는 신종교(新宗敎)의 신학 관념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신성을 인성의 연속으로 정의했을 때 신과 인간의 거리는 줄어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수양 혹은 영성(靈性)의 재배를 통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종교인들에게 ‘인격을 통한 민족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프로그램에 딱 들어맞는 일종의 윤리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은 이미 다시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서의 초자연적 사적(기적)들에 대해 변호하지 않았으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 속에서 그와 관련된 신학 관념을 제거하여 버렸다. 오직 일군의 보수적인 교파에 속한 기독교인들만이 전통 방식의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無誤性)을 옹호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존중하였으며, 옛날 예수의 신상(身上)에서 발생하였던 초자연적 사적들에 실제로 믿을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예수의 사역
예수의 인격과 신성을 공격하는 데서 나아가 반기독교 인사들은 또한 그의 세상에서의 사역을 비판하였다. 교육가의 관점으로부터 당시 광동교육위원회(廣東敎育委員會) 주석(主席)이었던 왕정위(汪精衛)18)는 기독교를 향해 질문을 제출하였다. 그는 우연히 광주제일공원(廣州第一公園) 안에서 기독교 전도 벽보로 보고 격분하여 짧은 수필을 써서 기독교에 ‘세 가지의 큰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왕정위는 기독교가 전하는 도리는 그 사상이 지나치게 편협하고 비관용적이어서 인정(人情)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그가 본 벽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당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19) 이러한 천당과 지옥에 대한 배타적 양자택일은 다른 종교 신앙들과 실천들을 위한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전통의 불교와 조상숭배의 예의(禮儀)는 기독교적 구원 방식에 의해서는 배척되고 적대시된다. 이러한 유아독존적 태도는 중국의 종교에 대한 관용적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는 환영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어째서 예수가 신(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두 번째 잘못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요 모든 민족들의 평화의 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광망(狂妄)한 것이다. 중국은 마침 막 근대화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제도를 사회생활 속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기독교의 독재적이고 전횡적인 주장은 시대의 요구에 위배되는 것이며 중국인들에 의해 호응될 수 없는 것이다.20) 왕정위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의 교조적 이론들은 근대사회의 교육 원리들과 대립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며 실제로 오늘날의 중국 인민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한 비판이 영근(靈根)이라는 필명을 쓰는 다른 작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의 〈근대시기에서의 예수의 자리〉라는 에세이는 아마도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퍼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풍속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써진 것이다.21)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는 고대 역사상의 한 종교 개혁가 이상이 아니다. 예수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속였다. 예수가 사역 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주장을 한 것은 타인들을 넘어서는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예수의 삶의 철학은 전제주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거짓된 약속을 함으로써 복종을 강요하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 대신에 자신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 것은 그의 이기적 동기와 자기중심적인 자만심을 보여준다. 그러한 사람의 사역에 기초한 기독교 사업은 일종의 지적인 자살이다. 그의 종교정책은 단지 ‘강요적이고, 신비하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종교가 중국 내부에 만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반드시 장차 인민의 복리와 인민의 국가를 위한 봉사정신을 해치고 말 것이다.
왕정위의 비판에 대해 남부 중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장역경은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공원 안에 붙어 있던 작은 벽보가 어찌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단지 한 장의 벽보에 근거하여 참된 실상을 따지지 않고 그토록 많은 말을 한다면 이는 또한 교육가가 마땅히 가져야할 풍도(風度)는 아니다. 왕정위가 한 말 “만약 그가 나에게 왜 이런 에세이를 썼냐고 묻는다면 나는 역으로 그에게 왜 그런 벽보를 붙였느냐고 물을 것이다.”라고 한 그의 말과 문장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반감, 편견과 적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22)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된 인간의 운명과 관련하여 장역경은 천당과 지옥에 대한 신학을 명료하게 하였다. 이들 이름들은 존재의 종말론적 상태, 즉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과 형벌을 지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일생동안 행한 일에 따라 천당 혹은 지옥이라는 두 가지 존재 경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그때에는 선(善)과 악(惡), 은(恩)과 원(怨)이 모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인류의 운명 문제에 관심을 두는 한 천당과 지옥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원에 붙은 벽보는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공포를 주거나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선의(善意)의 권고와 경계를 주고자 함인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은 공평(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는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그의 심판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설교자나 선교사도 사람들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인류를 위한 예수의 구원은 자신의 사랑과 희생 위에 건립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더욱 마땅히 그가 일찍부터 예비해 두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의 일생의 사역은 곧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함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저함 없이 힘을 다해 선포해야 한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23)
예수에게 독재적 성향이 있다는 왕정위의 비난에 대응하면서 장역경은 기독교를 정치와 한 가지로 뒤섞을 수 없음을 특히 당시의 중국 정치와 나란히 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과거 다윗 왕조를 중건할 메시아, 곧 정치적 지도자로 간주함으로써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다. 당연히 그들의 달콤한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예수의 왕권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관한 것으로서, 신도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결코 물질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장역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구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가 기독교 신앙의 ‘섬김(봉사)’의 관념에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왕정위의 비판을 뒤집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던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한편 일군의 자유주의(개방적)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중국 기독교인들은 천당과 지옥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들은 결코 천당과 지옥이 두 가지 영원한 존재 경계(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사회 혁신(사회적 효용성)의 각도로부터 해석하였다. 천당과 지옥의 구별은 직접적으로 사회 개혁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사명(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후세를 위해 하나의 아름다운 모범을 남겨서,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사회의 개조를 진행할 것인가를 교도(敎導)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낙원에서 사후의 삶을 보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만 ‘즐겁지만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24)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현실도피주의만을 양성할 뿐이다.
장흠사(張欽士)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예수의 희생과 봉사(섬김)정신을 본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25) 청년협회(YMCA) 간사 오요종(吳耀宗)은 5개년 운동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제도로서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빈곤과 불공평한 일(불평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인민들은 부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회의 임무는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의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26)
오뢰천의 신학사상도 또한 예수의 사회에 대한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의 사역은 세 가지 주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27) 예수는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몸소 모범을 보였으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는 결코 전제적인 폭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지고한 신이 계시며, 그 신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天父)요, 땅 위의 만민은 서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 것이다.28)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의 한 형제들이므로 마땅히 복(福)과 화(禍), 기쁨과 근심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예수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절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도덕적 수양을 탁월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29)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며 모두 서로 형제이다. 이러한 신학사상은 당시 매우 유행하였으며 특히 일찍이 서양에서 유학하였던 일군의 중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한 영적 교훈이라 믿었다. 예수는 자신을 그 자신의 인성에서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아무런 구별도 없는 동일한 존재로 가르치셨다. 그의 도덕성의 탁월함과 영성의 심오함은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지만 그것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적인 정도에서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확실히 중국인이 본받을 모범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본받을 만하기에 우리는 또한 마땅히 인격 수양과 사회봉사에서 그의 행적을 본받아 따라가야 한다.
미주
1) 陳獨秀, 〈基督敎與基督敎會〉, 《近來近十年來之宗敎思潮》, pp.190-192.
2) Ibid., p.191.
3) 張亦鏡, 〈與陳獨秀先生說〈基督敎與基督敎會〉〉, 《批評非基督敎言論彙刊全編》, pp.191-213.
4) Ibid., pp.195-196. 張亦鏡은 이 글을 Flavius Josephus, Jewish Antiquities 18의 3.3.으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번역하여 인용하였다.
5) Ibid., p.197.
6) Ibid., p.197.
7) 胡貽穀 (Y. K. Woo)은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며, 젊은이들의 도덕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성장(德‧智‧體‧羣의 四育)을 도모한 잡지책인 《靑年報》의 편집인이었다. 그는 National YMCA의 書報部의 실행 간사였다. 20년대 그의 저작 중 많은 것들이 애국주의와 사회개혁을 주장하였으며, YMCA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靑年進步》에 실렸다. 그의 작품 《人格與信仰》과 H. E. Fosdick's The Meaning of Faith에 대한 그의 번역(《信仰的意義》)은 매우 유명하였다.
8) 胡貽穀, 〈基督敎與耶穌基督〉, 胡貽穀 編, 《現代思想中的基督敎》 (上海: Association Press in China, 1926).
9) 趙紫宸, "Jesus and the Reality of God", 《眞理與生命》 제7권 제5기 (1933년 3월), p.1. 더 나아간 논의로서 趙紫宸, 《基督敎哲學》, pp.225-228, pp.232-239 참조.
10) 趙紫宸, "Jesus and the Reality of God", p.9.
11) 趙紫宸, 〈耶穌的上帝觀〉, 《生命月刊》 제2권 제2기 (1921년 9월), pp.1-15.
12) Ibid., p.3.
13) Hsu Pao-ch'ien(徐寶謙), "Uniqueness of Jesus from a Chinese Standpoint", p.30.
14) 徐寶謙, 〈基督敎在中國的前途〉, p.336.
15) Hsu Pao-ch'ien(徐寶謙), ed., "The Future of Christianity in China", p.4.
16) 吳雷川, 〈從儒家思想論基督敎〉, 《眞理與生命》 제4권 제13기 (1930년), pp.3-6. 그리고 吳雷川, 〈記念耶穌誕生的我見〉, 《眞理與生命》 제7권 제3기 (1932년 12월), pp.1-6.
17) 吳雷川, 《基督敎與中國文化》 (上海: Chin-nien協會, 1936), pp.82-98.에서 그 전체 논법을 확인할 수 있다.
18) 汪精衛 (1883-1944)는 국민당의 혁명지도자로서 孫中山과 가까운 정치적 동지였다. 20년대 초반에 그는 廣東에서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1924년 제1차 全國代表大會에서 國民黨 中央 行政委員會 위원에 선출되었으며, 孫中山의 비서장으로 일했다. 孫中山이 죽은 후 1925년 7월 그는 국민 정부의 主席으로 선출되었다. 蔣介石이 당 내의 右翼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당내의 左翼은 그의 지도하에 있었다. 종교 문제에서 그는 기독교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그것은 그의 저작 중 일부에 잘 나타나 있다. 南中國에서의 그의 지위는 반기독교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전기에 대한 소묘로서 Boorman, Biographical Dictionary 3, pp.369-373.가 있다.
19) 張亦鏡, 〈批評汪精衛的力斥耶敎三大謬〉, 《批評非基督敎言論彙刊全編》, p.87.
20) 汪精衛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의 세 번째 오류는 창조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그것은 진화론과 모든 과학 이론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21) 靈根의 에세이는 趙紫宸에 의해 번역되었다. The Chinese Recorder 52 (1921년 3월), pp.177-186.
22) 張亦鏡, 〈批評汪精衛的力斥耶敎三大謬〉, p.88.
23) 張亦鏡, 〈駁汪精衛的宗敎毒民論〉, 《批評非基督敎言論彙刊全編》, p.122.
24) 徐寶謙, ed., "The Future of Christianity in China", p.6.
25) 張欽士, 〈我個人的宗敎經驗〉, 《生命月刊》 제3권 제7-8기 (1923년 4월).
26) 吳耀宗(Wu Yao-tsung), "How One Christian Looks at the Five Year Movement", The Chinese Recorder 61 (1930), pp.147-148. 5개년 운동은 1930년 1월 1일 시작한 중국 기독교회의 운동이다. 그것의 목적은 중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영적인 삶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과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있었다.
27) 吳雷川, 〈從儒家思想論基督敎〉, pp.6-8.
28) Ibid., p.5.
29) 요한복음 14:6
사진 | 바이두
문석윤 |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