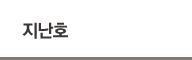큰 틀에서 보면, 작년 가을의 19차 당(党)대회로 시작된 시진핑(习近平) 2기에 전개될 사회조직관리정책은 이전 18차 당대회로 시작된 시진핑 1기 때와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시진핑 시기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당정(党政)의 정책적 인식과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이는데, 보다 상세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18차 당대회와 19차 당대회 모두 이전과 유사하게 사회조직들을 사회건설, 사회관리,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도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진행된 시스템과 제도개혁이 초래한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고 시행하게 된다. 그 새로운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사회건설과 사회관리가 그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 둘은 사회치리라는 개념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의 범주로 흡수 발전되었다.
사회건설의 핵심은 공공재와 사회경제적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그것의 제공 주체와 내용, 제공 방식의 다변화/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로컬과 사구(社区)거버넌스 등의 구축과 확충, 공민사회 내 사회조직(즉, 사회단체와 기금회와 사회복무기구), 사회기업(社会企业)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 등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사회관리란 이러한 사회건설의 과정에서 크게 증대된 공민사회와 로컬/기층의 역량과 볼륨, 그리고 개별적이면서 때로는 상호 결합된 그 요소들이 초래하게 될/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의 응집과 분출을 적절히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건설과 사회관리는 당정에게 있어 서로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쌍생체가 된다.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그 양자적 수단의 병행적 시행/활용, 그리고 그 이후 등장한 사회치리 전략의 의도와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체제 안정성의 유지와 당정 집권/집정능력의 증대와 강화이다.
둘째, 18차 당대회와 19차 당대회 모두 공통적으로 당 건설(党建, party-building)의 강화와 당 영도력 강화 원칙을 사회조직 관리정책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모든 영역에 있어 정치건설의 최우선적 배치(把政治建设摆在首位), 각급 기관과 조직 내 당의 정치기율 강화(加强党的政治纪律) 혹은 기율건설(纪律建设) 강화, 사상건설(思想建设), 조직건설(党组织建设) 강화 등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당 공작과 건설과 당의 영도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중국 내 모든 인가를 받은 사회조직들은 조직 내에 당 조직을 건립해야 한다. 새로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 사회조직들은 물론 그 이전에 등기/등록된 사회조직들 역시 사후에라도 모두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조직들에 파견된 당조(党组) 책임자들은 사회조직의 활동에 있어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지도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사회조직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당의 정책방침에 맞게 사회조직을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공민사회 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과 사회신뢰의 상실과 ‘이기주의’와 ‘배금주의(obsession with money)’ 현상 등에 대한 완화책으로 사회조직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의 전통적 문화가치(traditional culture)가 위의 현상들이 초래한 ‘사회적 공백(social vacuum)’ 혹은 ‘사회적 가치의 결핍(lack of social value)’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회구조의 분열/붕괴(disintegration of social fabric)’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응집의 기반이 되었던 전통적 문화가치는 유불도 등의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윤리였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적 위기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기존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조직들을 다시금 불러내고 복원하는 것은, 당정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당정은 그것 대신 중국 인민들의 공공(public)의식과 자원(volunteering)의식과 움직임(movement)의 확산, 공민사회제도의 발전과 공민사회 내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민사회 내 사회조직들은 윤리적(ethical) 가치, 문화적(cultural) 가치, 자선적/자원적(charitable/philanthropic) 가치와 사업활동을 표방하게 되면서 당정의 일정한 지원을 받아 제도적 공간과 범주 안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18차 당대회와 19차 당대회 모두 공민사회와 공민사회 내 사회조직들을 ‘정치 시스템(political system)’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정치 시스템의 건설 차원 중에서도 19차 당대회는 –그 이전 18차 당대회에 비해- ‘협상민주’의 영역에서 사회조직을 언급,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당-정부-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군중단체-기층조직-사회조직으로 통일적으로 연결되는 중국식 협상민주 제도와 기제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려는 당에게 있어 사회조직들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협상(consultation)’의 대상으로 포착되고 부상하게 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 당정이 자국 내 공민사회와 사회조직들을 대하는 정책적 관점과 입장은 큰 틀에서 볼 때 별 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캡처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