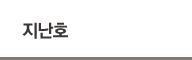중국기독교회사의 범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회의 역사 또한 그러하다. 근동지역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기독교회는 로마제국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동방선교의 과정을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 왔다. 한국에서 볼 때 중국 기독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필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회는 1세기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교리상의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열되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旧教, 天主教, Catholic)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교(景教, Nestorians) 등의 분파를 파생시켰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改新教, 프로테스탄트, Protestant) 각 종파의 출현을 가져왔다. 동방교회는 정교일치의 동방정교(东方正教, Orthodox)로 발전하면서 각국 차원의 정통교회와 많은 비정통교회를 성립시켰다.
기독교회의 역사가 복잡한 만큼 교회에 대한 지칭 또한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음을 감안하여 동방교회는 동방정교, 서방교회의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리한다. 이러한 종파 모두를 포괄하는 범주로는 기독교 또는 기독교회라고 표기한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분파에 대해서는 고유의 표현을 명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기독교회사의 시작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전파가 시작된 유대땅을 기반으로 성립되었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땅에서부터 사방으로 선교가 확장되어 나갔다. 선교가 시작된 뒤 지중해권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 황제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선교 영역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빠르게 전파되어 나갔다. 또 계층적으로 하층 민중에서부터 고관이나 황실 구성원에게까지 전파되면서 대중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로마제국의 통치자도 그리스도교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고 방대한 통일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A.D. 313년 로마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A.D. 306-337 재위)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칙령을 반포하고, 기독교 박해 정책을 종식시키고, “누구든지 무슨 종교를 선택하든지, 모두 자유이다.”라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기독교는 로마제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 전에 빼앗겼던 교회 재산도 다시 반환을 받았다.
그리스도교는 이때부터 빠르게 발전하여 당초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탈바꿈하였다. 그리스도교가 보편 종교인 까닭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모든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인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천직(天职)으로 여긴다. 사실상 그리스도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진 종교이다. 옛날부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적극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때로는 선교성의 종교라 불려진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A.D. 330년 정식으로 로마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제국의 중심이 그리스도교 세력이 강한 지역에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희랍어를 쓰는 동로마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고, 라틴어를 쓰는 로마교회의 존재와는 거리가 있었다. 로마교회는 자신들이 사도 베드로를 직접 계승하였다고 여겼으며, 동로마교회는 자기들이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라고 여겼다. 신학관점상, 종교의례상 쌍방은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격렬한 분쟁을 하였고 결국 1054년 동서교회로 크게 분열되었다. 원래 로마교회의 기초 위에 천주교가 세워졌고 동로마교회는 동방정교를 형성하였다.
중국기독교회사의 시작
중국에서 기독교회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개신교 선교만을 따진다면 19세기 이후부터 라고 하겠지만 기독교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면 상당히 많이 소급되어 올라갈 수 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16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의 각 수도회의 선교사들은 다투어 중국에 와서 선교하였다. 이때 이미 중국인들 중 다수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다는 문헌자료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인도에 도착한 유럽 수도회 선교사들은 인도 말라바르교회의 문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도마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문헌에서 “비록 성 토마스가 중국에서 거둔 선교의 성과는 미미하였으나 여하튼 중국에 그리스도교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 세메도(曾德昭, Álvaro Semedo, 1608-1658)는 1613년에 중국에 와서 교무를 22년간 담당하였으며, 그가 1642년에 출판한 《중국지(大中国志)》 중 한 시리아문 매일기도서를 인용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인도 우상숭배의 오류는 사도 도마로 인해 없어졌다. 중국인과 이디오피아인은 성 토마스에 감화되어 진리로 귀의하였다. 사도 도마로부터 그들은 영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마를 통하여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신봉하였고 그를 통하여 유일한 상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마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영광이 인도 전역에 꽃피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천국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1)라고 하였다.
‘동아시아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는 1546년 5월 10일 말라카의 암본(安倍那)에서 보낸 편지에서, 말라바르 교회에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성 토마스가 중국에 건너가 적지 않은 중국인이 믿음을 갖도록 했다.”2)라고 전한다고 하였다. 이후 1556년 포르투갈 도미니크회 수사 크루즈(克路士, Gaspar da Cruz, ?-1570)는 《중국지(中国志)》에서 이 전설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이 스스로 진실하고 거짓 없는 것으로 여긴 성서에서 언급한 바, 사도 도마가 말라바르에서 순교 직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얼마간 머문 뒤 그가 그곳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라바르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거둔 3-4명의 제자를 그곳에 남겨 두었다.”3)라고 하였다.
사도 도마의 중국선교에 대해서는 외국 서적에도 그리스도교도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였다는 산재된 기록이 있다. 마라마교회의 칼데안(Chaldean) 기도책에 “중국인과 애티아별인이 도마의 권면으로 참 도를 믿게 되었고, 도마의 노력으로 복음이 날개 돋친 새와 같이 중국으로 날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도마가 동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 인도 마드라스(Madras)와 마리버(Mariber)로 이동하며 전도하였고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4) 이것은 서방 기독교 세계가 일찍부터 멀리 동방에 중국이라는 지방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스도교도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였을 뿐 아니라 몇몇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였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도 도마가 인도 전도를 떠날 때 사도 바돌로매가 중국을 향해 전도를 떠났다는 설도 있으며,5) 후한대에 시리아선교사 두 명이 중국으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누에치기와 비단 제조법을 배워 갔다는 기록도 있다.6) A.D. 1세기 중·후반 로마제국의 대박해 때 로마제국의 압제를 피한 기독교인들이 동방으로 대거 이동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明帝(재위: 57∼75년) 때 서역 도호(西域都护) 반초(班超)가 서방 경략을 하였고, 휘하의 감영(甘英) A.D. 97년에 로마제국을 다녀왔던 사실이 있으며 이 무렵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음을 볼 때 이 당시에 기독교도 중국으로 전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기독교회의 역사가 A.D.1세기 후한(后汉) 왕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교 본래의 역사와 근접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하고 할 수 있다.
미주
1) 曾德昭 著, 何高濟 譯, 李申 校, 《大中國志》 (上海古籍出版社, 1998), 187-188쪽.
2) 方豪, 《中國天主敎史人物傳》上 (中華書局, 1988), 59쪽.
3) C. R. 博克舍 編注, 何高濟 譯, 《十六世紀中國南部行記》 (中華書局, 1990), 149쪽.
4) 羅金聲, 《東方敎會史》 (廣學會, 1941);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서울: 쿰란), 46-47쪽. 5) 王治心, 《中國基督敎史綱》 (香港: 基督敎文藝出版社, 1959), 25쪽;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서울: 쿰란), 47쪽.
6) 李成彬, 《中國史略》, 157쪽;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서울: 쿰란), 47쪽.
* 사비에르의 이름 표기는 그의 출신지 바스크어로는 프란치스코 샤비에르(Frantzisko Xabier), 스페인어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이다. 라틴어 표기로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영어로는 프란시스 자비에르로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네이버백과사전, 두산동아대백과사전에 근거하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Francisco Xavier)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사진 | 바이두
김종건 | 문학박사(중국사) •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