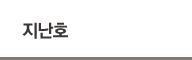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이통(李侗)이 주희에게 끼친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가 리일분수(理一分殊)설이다. 이 설은 존재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의 이론모형(틀)이다. 이통은 이러한 모형을 마음을 설명하는 데 적용시켜 미발의 중(희로애락의 미발)을 리일(理一)과 인(仁)을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통이 리일을 말함으로써 현상의 기(气)와 구별되는 본체로서 리일의 세계가 주희의 이론에서도 성립하게 되었다. 이통이 말하는 리일분수설에서 리일은 마음의 도덕적 본체와 그 본체의 어목불이(於穆不已)한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리일을 근거로 하는 분수리(分殊理)는 현실의 일상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리일에 근거한 분수리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중화를 이루는 법칙이 된다. 따라서 이통이 말하는 미발의 기상은 분수리•리일•도덕적 본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덕적 인격수양의 측면에서 대상을 지적한다면 도덕적 본체, 즉 본성의 이치이다.” -김수청-
송대 지식인들의 종교 문화
송대의 수양론에서 유불도를 막론하고 ‘앉는 일’은 묵좌(默坐), 정좌(静坐), 올좌(兀坐), 단좌(端坐) 등 여러 모양으로 뒤섞여 깨달음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양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불교는 격의불교(格义佛教)의 형태로 중국에 정착하여 불교 특유의 형이상학적인 면보다는 중국 문화 특유의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여 세상의 고통과 번민을 잊고 ‘인간의 본성’을 체득하는 현세의 종교 깨달음을 중시하였습니다. 곧 모든 의식의 외부 지향성을 끊어버리고 본체직관을 통해서 순수한 자의식과 마주하며 우주의 이치를 몸소 깨닫고자 한 것입니다. 주자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초년시절에 선학(禅学)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승인 이통을 만나 도남학파의 학풍을 잇는 수양론을 배우게 됩니다.
초기 주자 수양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이통과 ‘양시-나종언-이통’으로 이어지는 도남학파는 바로 본성의 체험을 수양의 종지로 삼아 본성인 불성을 깨닫는다는 견성성불(见性成佛)을 유학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수양론에 대입하려 시도했던 것에서 송대 성리학 수양론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통이 주자에게 가르쳐 준 수행법은 “묵묵히 앉아서 마음을 맑게 하여 천리를 체인하라(默坐澄心, 体认天理)”는 여덟 글자로 요약됩니다. 유학의 경전인 <중용>에서는 마음을 대상과 일에 대하여 발동한 때인 이발과 아직 외부로 발동하지 않은 때인 미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발의 상태가 중(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남학파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미발시에 중을 구하는 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곧 ‘미발체인과 구중(求中)의 수행법이 선종의 지상과제인 견성을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통하여 유교의 수양론으로 재구성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용의 미발’과 ‘불교의 선정’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도남학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미발시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김수청은 불교에서의 중은 참모습과 참인격의 존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반해 유가의 중은 도덕가치의 문제로서 선악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도덕실천의 주체성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통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마음이 대상을 갖지 않는 고요한 미발의 상태에서 체인(체득)하고자 하는 기상(气像)이란 인격의 덕성과 실천을 겸비한 성인(圣人)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도남학파가 지향한 미발수양의 목적은 종교적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주체성을 자각하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요한 중에 ‘안정’을 찾는 일은 송대 지식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실천보다 마음의 안정과 종교안식을 얻고자 하였고 그러한 열정이 신비주의이고 정적인 수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자의 스승이었던 이통은 현실을 떠나 신비적인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성인들의 본보기를 따라 도덕적인 자아를 완성하는 ‘인격수양’으로 미발수양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덕성이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 여전히 수양론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자 또한 불교적인 수행법과 유학적인 수양 사이에서 아직까지 혼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돈오적 수행법과 유학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후 주자는 계속해서 수양론의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자는 미발수양을 재검토하면서 도덕성을 ‘발견’하는 미발체인에서 꾸준히 ‘길러’나가는 미발함양을 주장합니다.
마음의 주체성과 인간의 도덕성
이통에게서 수학하던 시기의 주자 수양론은 도남학파의 ‘미발수양’을 인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다 흡수하지는 못했지만 의식의 흐름 이전, 곧 대상과 상황을 떠난 마음의 본체를 중시하는 시간인 ‘미발’을 수양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삼가라는 신독(慎独)의 수양도 이러한 미발수양에 속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보이지 않는 이익이나 사심을 위해서 외식함으로 드러내는 위선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대 성리학이 도덕심의 실천뿐만 아니라 도덕심의 본체에까지 관심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주체적인 마음에 의한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진정한 도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덕심은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의 본성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요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쯤에 서있는가라는 평정심을 유지한 고요한 상태에서 묻는 물음과 진지한 성찰은 바로 실천의 주체인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불쌍한 사람을 마땅히 불쌍히 여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외부의 상황이나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본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의 이치가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대하겠다는 자세가 유학의 미발수양 정신입니다. 때를 따라 선을 실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선한 본성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한 | 길가에교회 전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