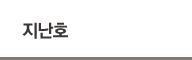선나1.jpg)
오랜만에 홍콩을 방문하면서 구룡반도 쿤통(홍콩명, 观塘)에 있는 중화기독교회 량파기념예배당(梁发纪念礼拜堂)에 가보았다. 이 예배당은 원래 1963년 12월 1일 설립된 뒤 2년여 뒤 1966년 1월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됐다. 중국 정부는 2004년 광동(广东)시 푸산(佛山)시에 있는 중국 최초의 목사인 량파(梁发, 1789∼1855)의 생가를 복원한 데 이어 그의 생전 사진과 저작 등이 전시돼 있는 기념관을 세운 바 있다. 참고로 푸산시는 무술인 황페이홍(黄飞鸿), 리샤오롱(李小龙)과 그의 스승 예원(叶问)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항페이홍기념관은 2001년 1월 부지면적 5000여㎡에 청(清)나라 식 2층 건물로 그의 유물과 사진, 그림 1000점 이상이 전시돼 있다. 리샤오롱기념관도 푸산에 있다.
량파는 중국에서 활동한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과 함께 사역한 중국인이다.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누가복음과 일부분의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인쇄공 출신인 그의 손을 거쳐 인쇄됐다. 광저우에서 소학교를 마친 그는 선교사 윌리엄 밀느의 인쇄소에 들어가 모리슨과 밀느가 번역한 서적들을 인쇄하는 일을 했다. 1816년 밀느에게 세례를 받고 중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기독인이 됐다. 첫 번째 세례 기독인은 모리슨의 문서 번역과 출판 사역을 도왔던 인쇄공 차이야가오(蔡亚高)였다. 량파는 모리슨과 밀느가 말라카에 영화서원을 설립할 때도 동참했다. 1819년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미신과 우상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구세록촬요약해’라는 책을 펴냈다. 이는 중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전도서적이다. 그는 1820∼21년 영화서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의 아내 리씨가 1820년 세례를 받고 중국 최초의 여신도가 됐다. 1823년 10월에는 그의 아들 량전더가 중국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광저우 지역 전도인으로 안수를 받고 중국 최초의 전도사가 됐다. 3년 뒤 모리슨은 그를 광저우의 목사로 임명했다.
량파의 대표작은 1832년 광저우에서 출판한 ‘권세양언’. 총 235쪽, 약 9만자의 9권으로 이뤄진 책자로 훗날 홍쉬취안(洪秀全)의 태평천국 건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세양언은 량파 자신의 기독교 이해를 바탕으로 쓰고 모리슨과 밀느의 성경번역본인 ‘신천성서’를 발췌, 전재한 것이다. 그는 앞서 자신의 개종과 세례, 전도 활동과 종교적 체험 등을 자술한 ‘숙학성리약론’을 출간했다. 량파는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대부에게 기독교 전단과 책 등을 배포하며 전도하는데 힘썼다. 1년에 나눠준 소책자가 7만권에 달할 정도였다.
량파기념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서양선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떠올랐다.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이래 1842년 난징(南京)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개신교 선교사는 24명, 세례받은 신도는 20명에 불과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설립한 1865년, 중국에서 사역한 개신교 기관은 30개 정도였다. 당시 선교사 91명이 활동하던 7개 지역에는 중국인은 2억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인 1억9700만 명이 거주하던 다른 지역에는 단 한 명의 외국선교사도 없었다. 외국선교사 수는 1900년 1500명에서 1919년 6636명으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선교사 국적은 영국과 미국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1900년에 영국선교사는 1400명, 미국선교사는 1000명, 그 밖의 유럽선교사는 100명 정도. 1900년 중국인신도 8만5000명, 1906년 신도 1만78251명, 1920년 신도 36만6524명.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신도가 4.3배나 증가했다. 중국인목사는 1906년 345명에서 1919년 1065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중국교회 안에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문화의 기독교화’, ‘신학의 토착화’,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던 움직임도 있었다. 1807년 이래 140여 년간 서구의 엄청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투입됐지만 중국을 복음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그의 일꾼을 준비해두셨다. 그 결과 세계교회가 주목할만한 교세 확장이 이뤄졌다.
중국 대륙에서 선교사들은 1950년대 모두 떠나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앞서 준비하셨다. 왕밍다오(王明道•1900∼1991년), 워치만니(倪柝声•1903∼1972년)), 양샤오탕(杨绍唐•1900∼1966년) 등. 왕 목사는 원래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가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1920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도로 살 것을 결심한 후 스웨덴선교사와 함께 사역한 그는 잡지 ‘영의 양식’을 발행하며 복음전파에 힘썼다. 1925년 가정교회를 개척한데 이어 1937년 ‘베이핑(北平)기독교회당’을 세웠다. 그 교회는 1958년부터 소년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고매한 인격을 중시하고 서양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거부하며 중국교회의 자립화를 실천했다. 성경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신학을 반대했다. 왕 목사는 세계적인 화교교회 지도자인 토머스 왕 목사를 양육하기도 했다.
1955년 8월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던 왕 목사는 긴급 체포돼 베이징 감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삼자회의 기관지 ‘톈풍’(天风)은 그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1956년 9월 그는 잠시 석방됐는데 조건은 삼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1차 구금 시 한순간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출감하게 된 것이라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철저히 참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삼자회의 고발로 다시 감옥에 투옥됐다. 그 후로 20여 년간 감옥에 있었다. 왕 목사는 무기징역, 그의 아내 류징원(刘景文) 사모는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1980년 1월 출감한 왕 목사는 오랜 감옥생활과 고초로 인해 두 눈이 모두 실명됐다. 자신의 20여년의 감옥생활에 대해 ‘그리스도와 밀월기를 보냈다’고 간증했다.
워치만니는 특정 종파를 반대하고 중생과 영적 성장을 강조했다. 가정교회의 신학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푸저우(福州)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7세 때 푸저우 삼일(三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 1920년 당시 영국성공회 선교사였다가 탈퇴한 뒤 형제회 소속으로 푸저우에서 활동하던 M. E 바버(중국명, 허셔우언)를 만나 침례를 받고 그녀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렀다. 바버 선교사는 교회 건물을 짓지 말고 신도들의 집에 집회소를 세워서 평등하게 서로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모임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워치만니는 1922년 푸저우에서 지방교회를 시작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발행, 배포한 후 7년 뒤 상하이(上海)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의 영향력은 커져갔다.
상하이집회에는 당시 선교단체 중국내지회, 런던선교회, 장로회에 속한 중국교회 지도자와 기존 자립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상하이집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 종파에서 벗어나 지방교회 형태인 집회소를 세웠다. 그중 워치만니가 이끄는 상하이집회소는 지방교회 운동의 중심이 됐다. 워치만니는 1931년 영국형제회의 대표단 8인이 상하이에 도착, 선교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런던의 ‘기독인교제센터’ 책임자였던 T. A 스파크를 만나면서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1940년부터 스파크가 파송한 영국선교사들이 상하이집회소에서 평신도 훈련을 감당했다. 워치만니는 1952년에 중국 정부에 체포된 뒤 1956년 상하이고등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7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병으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워치만니가 주도한 지방교회 운동은 각 종파와 선교회에 속한 신도들을 규합시키며 외국 선교단체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는 특정 교파를 반대하고 각 지역에 설립된 집회소를 통해 복음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양샤오탕은 산시(山西)성 취워(曲沃)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훗날 이름을 다윗으로 개명했다. 홍동(洪洞)의 기독중학교를 거쳐 1923년 당시 최고의 신학교로 유명했던 산동성 화북신학원에 입학,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1934년 모교인 화북신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영공단’(灵工团)을 조직, 복음 전파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해 겨울 ‘중국의 존 웨슬레이자 윌리엄 캐리’로 불리던 위대한 부흥사이자 선교사인 쏭상졔(宋尙节) 목사가 취워에서 전도인을 위한 수양회를 개최하자 그는 영공단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큰 은혜를 받았다. 그 후 그들은 복음화 운동의 기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1936년 중국공산당의 발호로 영공단의 활동은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1939년 마침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해체됐다.
이후 베이징으로 이주한 양샤오탕은 성경학교를 설립, 교수로 활동하며 베이징기독도회당의 왕밍다오, 쏭상졔 목사 등과 교류하면서 복음전파에 앞장섰다. 또한 1948년엔 상하이 태동신학원에서 난징 중화신학원의 요청을 받고 전임교수로 봉직했다. 그해 여름 난징에서 열린 제2회 전국기독 학생 수련회의 주강사로 활동했다. 이때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300여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양샤오탕이 이끌던 난징교회와 중화신학원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반동사상가’, ‘친제국주의자’, ‘반정부주의자’란 죄명을 뒤집어쓰고 난징교회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양샤오탕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상하이에서 은밀히 사역했다. 1958년에 노동개조소에 보내어졌다가 1966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는 ‘한 교회가 교파를 강조하게 되면 이미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사람의 계명을 교회 안에서 교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노선’, ‘하나님의 일꾼’, ‘교회와 일꾼’ 등을 집필했다.
왕밍다오, 워치만니, 양샤오탕 외에도 오늘의 중국교회를 있게 한 이들이 적잖다. 21년간 감옥에서 보내던 중 13년을 러시아 국경에서 별로 멀지 않은 매서운 동북지방 헤이롱장(黑龙江)성의 노동개조소에서 지낸 위안상천(袁相枕, 1914∼2005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여전히 설교하며 매년 베이징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백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 다른 가정교회 원로 지도자였던 린센가오(林献羔, 1924∼2013년), 셰모산(谢模善. 1918∼2011년). 하나님은 이들을 주님의 병기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활력 있는 기독교공동체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다.
1992년 이래 한국교회는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연약한 중국교회들을 도우려고 애썼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1984년까지 내한 선교사 수는 2956명. 이들은 학교, 병원, 고아원, 출판사 등을 설립해 한국을 업그레이드 했을 뿐 아니라 술, 담배, 아편, 축첩, 조상숭배(제사) 금지 등을 통해 윤리적, 종교적 순기능을 극대화했다.
한인선교사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한 일은 이들의 성과와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교회인 삼자회는 물론 전통 가정교회, 도시신흥가정교회 등에 이르기까지 한인선교사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 갔다.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재입국 불허 또는 추방을 당한 한인선교사들이 꽤 많다. 하루아침에 사역지들을 잃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남겨놓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한인선교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기 쉽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일정 기간 안식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사역지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선교사 파송하기를 주저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 중국교회 상황 변화에 걸맞는 탁월한 사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외부 도움이 중국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자립’, ‘자양’, ‘자치’를 위해서라도. 결코 문화제국주의적인 모습은 안 되지만. 제2, 제3의 량파, 왕밍다오, 워치만니, 양샤오탕, 위안상천, 린센가오, 셰모산을 중국교회에서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여, 기죽지 말고 일어서기 바란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站起来, 一起走吧).’
왕빈 | 중국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