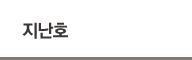2.JPG)
상황화 (contextualization)란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의 코드로 복음을 포장해서 현지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속에 이런 상황화의 원리들이 들어 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화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 역동적 등가 (Dynamic equivalent)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자신이 섬기는 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단어를 소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미 그 사회 안에 있는 단어로 대체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를 가져다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역동적 등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도둑이 없는 부족 사회에서 도둑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 것인지. 양을 본 적이 없고 돼지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천 명에게 떡을 나누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어로 브레드 (bread)라고 되어 있는 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쌀로 만든 떡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빵이라고 했다면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는 파리바게뜨도, 뚜레쥬르도 없었기 때문이다. 빵과 떡은 그 재료, 조리 방법도 다르지만 기능도 다르다.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빵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라기보다는 간식이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빵이라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 조선 사람들이 익히 아는 떡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문화의 토속적인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에 간 선교사들은 토속적인 이름인 보르항과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 준 ‘하늘의 주인’을 의미하는 유르텅청 에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갈등했다고 한다. 하지만 후에 몽골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르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자 더 많은 몽골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 상징 빼앗기 (Symbol theft)
상징 빼앗기란 에딘버러대학의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스 교수가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교도들의 종교적 용어를 버리고 낯선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가서 주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기사는 우리에게 대단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이교도들인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의미로 기독교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종교적 용어들을 모두 갖다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를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불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도 같은 것이다.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다만 우리와 조금 다른 형태를 지닌다.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언급한다. 필자의 어머니는 필자가 예수를 믿을 당시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이었다. 15년 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필자는 선교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었다. 국제전화로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을 하셨다.
“그래, 걱정마라.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갑오생 손창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신다. 고3 때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갑오생 손창남’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가 태어난 해가 1954년 갑오년이다. 어머니는 기도하는 법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앞에 생년월일을 붙인다고 해서 뭐라고 나무라실 분이 아니다. 필자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셨다.
● 구속적 유사 (Redemptive analogy)
구속적 유사란 각 민족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을 말한다. 그것은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각 민족이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인식하도록 미리 준비시켜놓으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복음을 이해하도록 그들이 문화와 역사를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돈 리처드슨은 이를 ‘문화답사’라고 부른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 (현재 파푸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 배신을 가치로 여기며 사는 그곳 사위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신약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복음서의 뒷부분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말에 부족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한 후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오랜 싸움을 끝내는 과정에서 각 부족장의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보고 리처드슨 선교사는 하나님과 부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했다. 부족들 사이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익숙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따라서 유월절 등의 구속적 유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해주셨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처음 교회에 가서 ‘예수의 피 밖에 없네!’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매우 거북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나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타문화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손창남 | OMF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