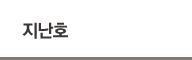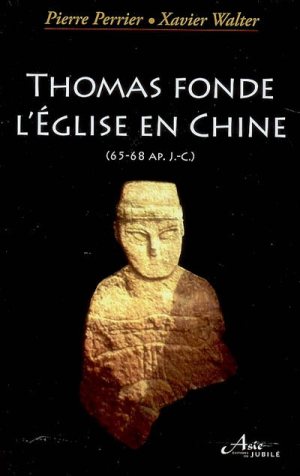1623년 혹은 1625년에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에서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가 발굴되면서 이미 당나라 때에 중국에 기독교(복음)가 도래하였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781년에 세워진 이 경교비에 따르면, 당 태종 때인 635년 경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들어와 거류하며 선교하여 널리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 교류가 있었다는 바일 터인데, 기독교(복음)는 언제 중국에 처음 도래하였을까?
2008년에 프랑스에서 두 학자 페리에(Pierre Perrier)와 월터(Xavier Walter)가 중국교회의 시작에 대한 책을 출간하여 학계에 큰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65-68년경 사도 도마가 인디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와 선교하고 중국교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는 그들 나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4세기경 쓰여 진 위경 중 하나인 <도마행전 (Acts of Thomas)>에 따르면, 사도 도마가 인디아의 선교사로 선택되었으나 가기를 주저하자 주님께서 그를 목수 노예로 인디아 한 왕국에 팔았고, 그가 결국 거기로 가서 선교하다 순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도마행전>에 기록된 바는 아니지만, 또다른 전승에 따르면, 사도 도마가 중국까지 가서 기독교(복음)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와 순교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것이라 할까, 인디아 서남부지방 말라바르(Malabar)에는 지금도 그가 전해준 기독교(복음)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성 도마 교단(Mar Thomas Church)이 있는데,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성으로 드렸던 기도문 중에 사도 도마의 중국선교에 대한 언급이 몇 있다.
“성 도마로 말미암아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진리로 돌아섰다.”
“성 도마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중국에까지 퍼져나갔다.”
대항해시대가 도래한 16세기와 17세기 초 인디아에 온 포르투갈의 탐험가들과 역사가들도 인디아 서남해안과 동남해안에서 사도 도마의 인디아와 중국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술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그런 기록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초기 예수회 중국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寶, 중국 체류 1583-1610년)도 중국에서 사도 도마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관한 일부 모호한 언급들을 접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많은 학자들은 말라바르의 기도문이나 사도 도마의 인디아와 중국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페리에와 월터는 확신을 갖고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중국에서 찾으려고 많은 수고를 했고, 장쑤성(江蘇省) 롄윈강시(連雲港市) 콩왕산(孔望山)의 마애 유적군을 주시하게 되었다.
장쑤성 동북부에 위치한 콩왕산은 본래 공자(孔子)가 이 산에 올라 동해 즉 황해를 조망하였다 하여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여기 동서 17m, 높이 8m에 달하는 화강암 산자락에 18군 105체의 인물이 단독 혹은 군상으로 부조되어 있다. 제일 큰 것은 높이가 154cm에 달하며, 작은 것은 10㎝ 정도이다.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즉 나신의 역사상, 원형 두광이 있는 오존상, 연화를 가진 공양자상, 머리에 육계(肉髻)가 있고 법의를 걸치고 손에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입상, 같은 모양의 결가부좌상(結跏趺坐像)을 한 57체의 열반 군상,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듯한 상 등 독특한 모습도 보인다.
1980년 베이징역사박물관은 이 마애 유적군을 대대적으로 학술조사 하였다. 그 결과 산에 있는 바위의 본래 형태에 자연스럽게 조각을 한 이 부조들이 중국의 불교조상예술의 최초 작품으로 꼽힌다고 발표하였다. 표면에는 후한시대 화상석의 저부조수법과 흡사한 데가 있어 1세기 혹은 2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둔황(敦惶)의 불교조각에 비해서도 100년 혹은 200년이나 앞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교와 연관된 유적군일까? 일부 학자들이 당시 이 지역에 도교 일파인 태평도(太平道)의 중심인 동해묘의 제단이 있었고, 아마도 그것과 관련되는 마애 유적군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이 유적군을 불교와 연관 지웠다. 이 유적군이 위치한 항구도시 롄윈강은 중국 역사 초기에 중요한 항구 가운데 하나로, 해로를 통해 중국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중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항구가 되었다. 또한 여기 일부 마애 부조물들의 연대가 후한 명제(明帝, 재위 57-75년)의 재위 시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이것들은 인도불교가 해로 비단길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해안을 거쳐 들어오던 당시의 산물이며, 부조된 인물들 역시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그동안 심각하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적어도 지난 10여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최근 비록 소수의 학자들이지만 이 마애 유적군이 혹은 그 중 일부의 부조물은 불교와 관련되거나 거기 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기독교(복음)가 중국에 전래될 당시의 기독교나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2008년 페리에와 월터가 <도마 중국교회 설립> 이란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왜, 무엇에 근거하여 이 책을 출간하고 그런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일까?
|
|
페리에와 월터의 도마 중국교회 설립 책 표지 |
인디아 남부((Mylapore)에 있는 사도 도마의 무덤 |
김석주 | 장로회신학대학교 아시아교회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