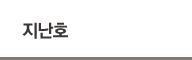아침 채색 구름 속에서 백제성을 이별하고
천리 강릉길을 하루 만에 돌아간다네
강 양쪽으로 원숭이 울음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가벼운 배는 벌써 만첩 산을 지났구나
朝發白帝彩雲間,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住,輕舟已過萬重山。
주석
1 早發(조발) - 일찍 출발하다.
2 白帝城(백제성) - 서한 말 촉(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백제 공손술(公孫
述)이 쌓은 성. 봉절(奉節) 구당협(瞿唐峽) 부근에 있다.
3 辭(사) - 작별하다. 이별을 고하다.
4 彩雲(채운) - 채색 구름.
5 江陵(강릉) - 지금 호북성 형주시(荊州市).
6 啼不住(제부주) - 끊임없이울다. ‘주(住)’는 멈춘다는 뜻.
7 萬重山(만중산) - 첩첩 산중. 삼협을 통과하는 구간에 끝없이 이어진 산들을 가리킨다.
이 시는 숙종 황제와 영왕(永王) 이린(李璘)의 권력 투쟁에 연루되어 멀고 먼 야랑(夜郞)으로 유배를 가던 이백이 백제성에 이르러 사면령을 받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노래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천고의 절창이다. 이미 육십 가까운 나이에 들어선 이백에게 하늘 끝 불모의 땅 야랑으로의 유배는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을 터, 그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사면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으리라.
이백의 감격과 환희는 시의 곳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백제성을 둘러싸고 있는 영롱한 채색 구름은 길고 긴 절망의 어둔 밤을 통과하여 마침내 희망의 밝은 아침을 맞은 이백의 찬란한 기쁨을 상징한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조가 혼란에 빠지고 장안과 낙양이 함락되자 촉으로 피신한 현종은 두 아들 이형(李亨, 훗날의 숙종)과 이린(李璘)으로 하여금 각기 군대를 이끌고 남북에서 협공하여 안록산 군대를 저지할 것을 명하였다. 태자인 이형은 북쪽에서 군대를 모아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도록 하고, 영왕 이린은 남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안록산의 본거지를 공략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마침 남쪽 여산(廬山)에서 머물고 있던 이백이 영왕 이린의 부름을 받았고 그는 사직을 안정시키고 창생을 구한다는 일념에 기꺼운 마음으로 영왕의 막부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백은 영왕의 군대를 칭송하는 <영왕동순가(永王東巡歌)> 10수를 지어서 이 구국의 전쟁에 참여한 기쁨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급변했다. 태자 이형이 스스로 황제에 올라 연호를 지덕(至德)으로 바꾸고 아버지 현종을 태상황으로 밀어내 버렸으며, 동생 영왕에게 군대를 거두고 현종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영왕이 숙종의 명을 거부하자 황제는 영왕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대는 패하고 영왕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백은 내란 부역죄라는 죄명으로 심양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일 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야랑으로 유배되어 심양 감옥을 출발한 것이 작년 봄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었던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절망했던가! 옥살이 한 해, 유배길 한 해, 그 이년 동안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백제성의 사면의 외침! 이제 이백은 아침 햇살의 축복을 받으며 강릉으로 귀로에 오른다. 강릉까지는 천리 여정이다. 중간에 칠 백리 삼협(三峽)의 험한 뱃길을 지나가야 한다. 이 험한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던 것이 지난해 겨울이었다.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이백은 <삼협을 오르며(上三峽)>라는 시에 오롯이 적었었다.
무협에 끼어 있는 푸른 하늘이여
끝없이 그리로 흘러가는 장강이여
강물은 문득 다 흘러간 듯한데
푸른 하늘은 여전히 가 닿을 수 없구나
사흘 낮 황우협
사흘 밤 황우협
세 번의 아침
세 번의 저녁
어느새 하얗게 머리칼 세었구나
협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뱃길이었으므로 삼일 밤낮을 가도 황우협 언저리에서 맴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배를 삼킬 듯 한 협곡의 두려운 물결도 살을 에는 듯한 혹한의 겨울바람도 기약 없는 유배의 길을 가는 이백의 심연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한 끝에 이듬해 봄에야 겨우 백제성에 닿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다시 간다. 죄인이 아닌 자유인의 몸으로 다시 간다. 그의 가벼워진 몸을 실은 배가 두 달 여정 천리 길을 하루 만에 사뿐하게 돌아간다.
백제성에서 강릉까지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가는 뱃길이라서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구절은 이백을 태운 배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보다는 그의 마음의 가벼움을, 무거운 절망을 다 벗은 뒤의 후련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지난 겨울 삼협을 오르던 이백을 거칠게 막아섰던 겨울바람도 어느새 봄바람으로 바뀌어 부드럽게 이백이 탄 배를 밀어주었을 것이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뀌는 것 아닌가! 바뀐 것은 비단 바람만이 아니었다. 셋째 구에 등장하는 협곡 양쪽 기슭에서 우는 원숭이들의 울음소리도 바뀌었다. 삼협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의 울음소리가 종종 협곡에 메아리 쳤는데, 이 울음소리는 뱃길을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부들은 이 길을 가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파동 삼협,
길고 긴 무협에 들리는 원숭이 울음소리
그 소리 세 번 듣고 그만 울고 말았지요
巴東三峽巫峽長,猿鳴三聲淚霑裳。
특히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은 너나없이 원숭이 울음소리에 애간장이 끊어졌다. 두보도 깊은 가을 무협에 메아리 치는 원숭이 울음소리를 듣고는“바람 급하고 하늘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구나(風急天高猿嘯哀- <登高>)”라고 써서 만리타향에서의 외로운 마음을 적었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나 멀고 먼 곳으로 귀향 가는 유배객의 경우에는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주는 울림은 각별하였으리라.
그런데 이백이 사면을 받아 강릉으로 귀환하는 이 시기에 협곡을 울리는 원숭이 울음소리는 어느 한 구석에도 쓸쓸하거나 애처로운 느낌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시인의 사면과 귀환을 축하해주는 환호성이거나 팡파르처럼 들린다.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니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주는 의미가 확연하게 바뀐 것이다. 그 축하의 노래가 삼협 칠백 리 길 내내 이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장면인가. 이 이백의 시에 이르러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슬픈 것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이백을 실은 배가 첩첩 산이 이어지던 삼협의 험한 뱃길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서 넓은 장강으로 나온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만첩산’과 같이 끝없이 이어지던 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넓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이백은 환희의 찬가를 부르며 자유의 날개를 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 시에 대한 역대의 평가가 후한데, 명대 양신(楊愼) 같은 사람은 이 시가“바람과 비를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게 만든다(驚風雨而泣鬼神-<升庵詩話>)”고 할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즐겨 인용하고 낭송하는 것은 이 시 행간에서 용출하는, 천 년 긴 세월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시인의 환희와 감격 때문일 것이다. 유형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절망하고 삼협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고단한 사람들은 이백처럼 자신에게도 도달한 백제성을 꿈꾸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시성 두보에게도 환희의 찬가가 있다. 대부분의 두보의 시가 침울하고 비장한 풍격을 띠고 있어 이 환희의 찬가는 대단한 희소성의 가치를 지닌다. 이백의 환희의 찬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바로 <관군이 하남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듣고(聞官軍收河南河北)>라는 시이다.
검각 밖에서 전해진 수복 소식이여
처음 듣자마자 펑펑 울었네
아내와 아이들도 벙글벙글
서책을 주섬주섬 기뻐 미칠 것 같네
대낮부터 맘껏 술 마시며 노래 부르나니
푸른 봄에 짝을 지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곧바로 파협을 출발해서 무협을 지나
금방 양양으로 내려가서 고향 낙양까지 향하리라
劍外忽傳收車北, 初聞涕南滿衣裳。
却看妻子愁何在, 漫卷詩書喜欲狂。
白日放歌須縱酒, 靑春作伴好還鄕。
卽縱巴峽穿巫, 便下襄陽向洛陽。
전쟁으로 고향 낙양을 떠나 타지를 전전하다 만 리 먼 사천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여러 해, 두보는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광덕(廣德) 원년(763) 봄 관군이 반란군의 수중에 있던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보의 고향인 낙양은 하남에 속하였으므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긴 것이다. 수복 소식을 듣자마자 감격에 겨워 펑펑 울어 옷이 축축해졌다. 늘 수심에 겨워 웃음을 잃어버린 늙은 아내도, 늘 떠돌이 생활에 지쳐 풀죽은 아이들도 기쁜 소식에 함박웃음이다. 시인은 벌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서책들을 챙기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손발이 덩실거리느라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대충대충 상자에 쑤셔 넣는다. 그리고는 기뻐서 미칠 것 같다고 소리친다. 기뻐서 미칠 것 같다는 뜻의 ‘희욕광(喜欲狂)’처럼 탐나는 말이 또 있을까? 이제 진짜 미치기 전에 기쁜 마음을 풀어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술과 노래다. 밝은 태양이 빛나는 백주 대낮에 맘껏 술을 마시면서 크게 노래를 불러 기쁨을 표시한다. 그 다음 구절에 “푸른 봄에 짝을 이루어 고향으로 어서 돌아가리라”라는 말은 어쩌면 두보가 여럿이 함께 부른 노래의 가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차례로 쓴 것인데, 두 구절 안에서 지명이 네 번이나 쓰였고 ‘협(峽)’과 ‘양(陽)’ 두 글자는 중복해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두보 가족을 실은 배가 쏜살 같이 삼협 칠백 리 길을 넘고 한수(漢水)를 타고 올라 양양을 지나 고향 낙양으로 향하고 있다. 아니 두보의 마음은 벌써 고향 집에 도착해서 사립문을 밀고 있는 중이다. 평생에 그리운 동생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청대 포기룡(浦起龍)은 이 시를 ‘두보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유쾌한 시’라고 평했다.
고단한 일상에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기가 어디 쉽겠는가. 하지만 일생 중 누구나 감격과 환희의 시절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짧지만 강렬했던, 한 순간의 감격과 환희에 대한 추억은 어쩌면 우리의 길고 긴 고단한 삶을 버티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환희의 찬가 한 곡 쯤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백처럼 죄사함의 감격을 노래할 수도, 두보처럼 회복에의 기쁨을 노래할 수도 있으려니, 그 환희의 찬가에 우리의 삶은 만첩 산을 통과해가는 가벼운 배처럼 즐거이 순항할 수 있으려니!
김성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교수